시(詩) 세계의 존재론적 서정

필자는 문암의 시집 『바람과 시간의 숨결』에 대한 작품 해설을 통하여 시집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 시집은 오랜 세월 삶과 자연,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해 온 시인의 깊은 사유와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그의 시편들은 시간 속에서 스러지는 것들에 대한 애틋한 시선과, 그 너머 영원으로 향하려는 인간의 내적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과 시간의 숨결』은 시인이 지나온 삶의 여정과 그 속의 철학적 성찰이 응축된, 귀한 시적 유산이다.
1.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존재의 윤리
文岩 염성철의 시집 『바람과 시간의 숨결』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길러왔는가를 탐문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서정의 기록이다. 그의 시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시간 속에 응고된 감정의 결을 더듬으며 “흘러간다는 것은 곧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인식을 시적 신념으로 세운다.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는 감사와 견딤의 윤리이다. 상실을 미화하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시인의 시선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는 고통을 체념으로 봉합하지 않으며, 그 내부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온기를 길어 올린다. 그 따뜻한 잔광이야말로 문암 시의 미학적 근간이며, 세월을 대하는 존재론적 태도이다.
서시의 역할을 하는 <한지>는 시집의 시적 세계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낸다. 닥나무 껍질을 벗기고 두드리며 한 장의 종이를 완성하는 노동의 과정은 곧 인간과 시간이 맺는 관계의 은유이다. “시간은 조용히 자신을 펴내고 있었다”는 구절은 시집 전체의 사유를 응축한다. 시간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조용히 형태를 빚어가는 생명적 존재로 인식된다. 닥나무의 질긴 결은 세월의 흔적이자, 인간의 인내가 새긴 결이다. 시인은 이 과정을 통해 삶이란 기다림과 눌림의 연속이며, 그 견딤이야말로 생의 품격임을 보여준다.
2. 견딤의 미학, 그리고 삶의 온도
<사라의 바다>는 시집의 정서적 중심에 놓인 작품이다. 태풍 ‘사라’의 상흔을 매개로 시인은 인간 존재의 운명적 고통을 사유한다. 그러나 그는 비극의 표면에 머물지 않는다. 자연의 폭력 속에서도 다시 살아남는 인간의 윤리를 탐색하며, “사람은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시집의 도덕적 축으로 세운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지만 동시에 생명을 품는다. 시인은 이 양가적 상징 속에서 인간 내면의 심연을 비춘다. 바다는 외부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깊은 곳이며, 폭풍과 잔잔함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견딤의 미학, 즉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과정을 노래한다.
<송정리의 겨울>은 개인적 기억이 사회적 서정으로 확장되는 지점이다. 어린 시절의 도시락, 연탄 냄새 밴 골목, 어머니의 한마디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억의 회복이다. “그때 왜 밥을 눌러 달라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어머니의 말은 세월을 건너온 사랑의 언어로 울린다. 여기서 ‘눌러 담은 밥’은 단단히 삶을 붙드는 마음의 은유이며, 과거의 가난은 회한이 아니라 정서적 풍요로 변모한다. 문암의 시선은 과거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감사의 윤리와 인간적 연대의 품격을 되살린다.
시집의 중반부에서 시적 시선은 노동과 자연, 그리고 생명의 순환으로 확장된다. <가락국수>는 짧은 열차 정차 시간에 국수를 들이켜는 찰나를 통해 삶의 온기를 포착한다. 뜨거운 김 속에서 시인은 ‘살아 있음’의 체온을 느낀다. 이러한 일상의 미세한 순간이 존재의 근원적 기쁨으로 승화되는 점이 문암 시의 중요한 미학적 특질이다. <소나무>와 <연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모두 존재의 의지를 상징하며, 시인은 그 행보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윤리적 리듬을 읽어낸다. 이는 단순한 생태적 감상이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근원적 리듬에 대한 철학적 사유이다.
3. 머묾과 소멸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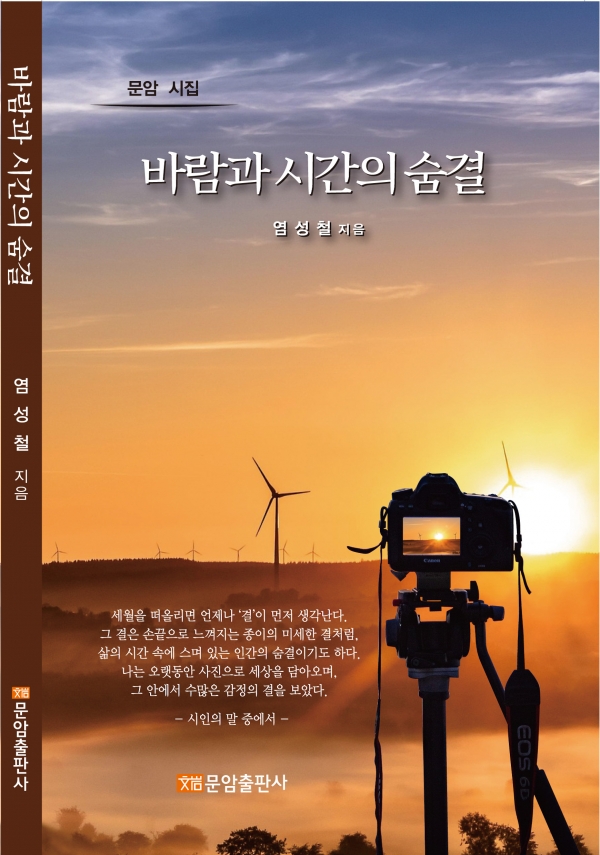
<일탈>, <북촌길과 고서>, <가을 끝자락>에서 시인은 도시적 시간 속의 고독을 응시한다. 그러나 그 고독은 절망이 아닌, 세월을 견딘 자의 조용한 품격이다.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고,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있음을 사랑한다. 북촌의 좁은 골목, 낡은 책, 가을의 낙엽들은 모두 머묾의 풍경이자 지속의 은유이다. 시인은 이 정적 속에서 존재의 진실을 발견한다. 삶의 깊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머묾에서 자란다는 통찰이 그곳에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시집은 죽음과 소멸의 주제로 향한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노래가 아니라 사라짐의 미학이다. <꽃처럼 지는>에서 시인은 “지는 순간이야말로 생의 빛이 가장 선명한 때”라 말한다. 피어남보다 지는 과정에서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다. <그리움의 무늬>와 <멈칫> 또한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에 놓인다. 죽음은 더 이상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순환의 시작이며, 시간과 존재가 다시 만나는 지점으로 그려진다.
문암의 시(詩)는 거대한 서사나 실험적 기법보다 일상의 구체적 이미지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복원하는 진실성에 그 힘이 있다. 닥나무의 결, 바다의 숨결, 연탄 냄새 밴 골목길, 이 모든 이미지들은 한 인간이 견뎌온 세월의 결을 정직하게 엮어낸 기록이다. 그의 언어는 절제되어 있고, 감정은 깊으나 과장되지 않는다. 그 절제는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태도이며, 오래 바라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다.
결국 이 시집은 회한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찬가이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온기와 품격이다. 그 답은 어쩌면 한 그릇 국수의 김처럼, 저물녘 햇살의 결같이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남는 삶의 온도일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선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1.30.](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41689/ap-29-2026-01-30.jpg?w=318&h=211&l=42&t=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