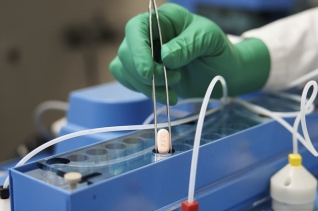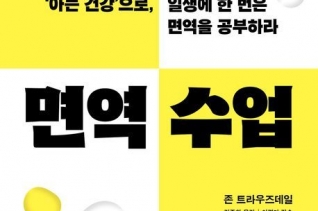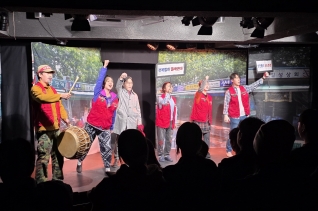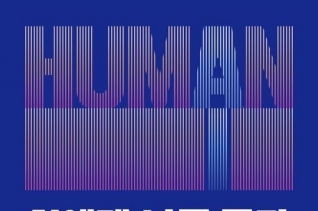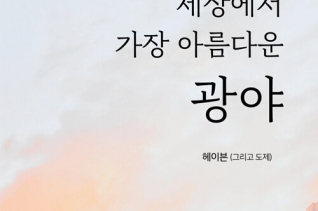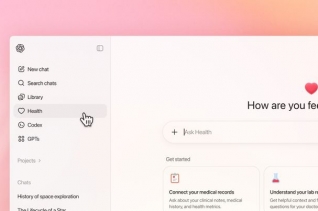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면서 원자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지정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의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포함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이스라엘, 대만 등 총 25개국이었다. 해당 국가들은 주로 테러 위험이 높거나 미국의 경제·군사적 제재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한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는 26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원자력과 핵 비확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연구·개발(R&D)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 원자력, 양자 등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협력과 인력 교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가 제한될 수 있어 한국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주요 원자력 기술은 미 에너지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됨으로써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민감국가 지정 조치로 인해 이러한 협력 관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단행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등이 이번 결정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어 정확한 배경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오는 3월 15일 민감국가 지정 조치가 공식 발효되기 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정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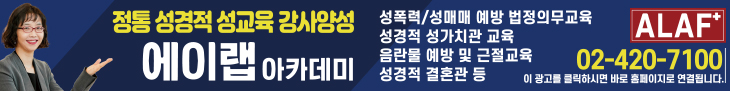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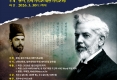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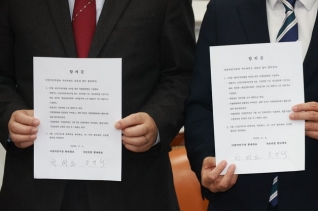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1.30.](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41689/ap-29-2026-01-30.jpg?w=318&h=211&l=42&t=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