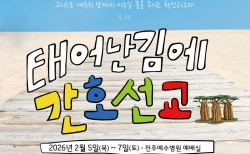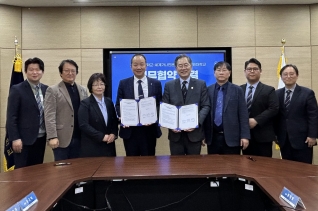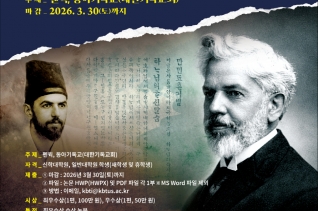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칼 R. 트루먼 교수의 기고글인 ‘유아 세례는 학대가 아니다’(No, infant baptism is not abuse)를 5일 (현지시각) 게재했다.
트루먼 교수는 그로브 시티 칼리지의 성서 및 종교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종교 및 공공 생활 분야의 윌리엄 E. 사이먼 펠로우로 재직한 바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른바 ‘치유의 시대(therapeutic age)’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온전하고 일관된 도덕적 위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소셜미디어의 전면적 확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지만, 정작 발을 딛고 설 확고한 기준이 없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사소한지를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라는 호칭이 가장 탐나는 지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도 겪고 싶어 하지 않을 진정한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그 ‘상’을 차지하려 든다.
최근 아일랜드의 유력 가톨릭 인사 한 명이 『아이리시 타임스(The Irish Times)』에 기고하며, 새로운 ‘피해자 범주’를 제안했다. 바로 유아 세례, 특히 가톨릭교회가 행해 온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라는 것이다. 아일랜드 전 대통령이자 교회법 전문가인 메리 맥알리스(Mary McAleese)는 이를 두고 “종교와 관련해 아동의 권리를 장기간, 구조적으로, 그리고 간과된 방식으로 심각하게 제한해 온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까? 이란에서는 잔혹한 종교 체제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맥알리스는 유아 세례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도덕적 방향 상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첫째, 맥알리스는 세례가 “원죄를 씻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문을 연다”는 등의 ‘영적 유익’을 가져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녀가 문제 삼는 것은 세례가 교회의 평생적 구성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례가 수반하는 객관적 책임을 두려워하는 그녀의 주장은, 교회가 세례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 참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 결국 그녀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치유 중심적 영성 소비자’처럼, 자신을 위로하는 요소는 취하고 불편하거나 부담을 요구하는 요소는 버린다.
둘째, 그녀가 사용하는 과장된 표현은 설득력이 없다. 맥알리스는 자신의 유아 세례를 돌아보며 “7½십 년 전 어느 일요일에 이루어진 짧은 세례 예식만큼 내 삶을 강력하게 형성하거나, 나의 양도할 수 없는 지적 인권에 그토록 막대한 제약을 가한 것은 없었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그녀가 받은 교육은? 결혼은? 자신이 낳아 기른 자녀들은? 친구와 스승들과의 지적·영적 관계는? 그 어떤 것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한 번의 예식보다 더 깊이 그녀의 삶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는 쉽게 믿기 어렵다.
셋째, 그녀는 우리가 이미 세속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가 지적했듯, 오늘날 우리는 15세기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들과 달리 우리는 ‘선택’해서 믿는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도발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조차 일종의 ‘프로테스탄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종교 선택의 시대를 사는 존재들이다. 오늘날 유아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가 스무 살 이후에도 신앙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세례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탈교자를 여전히 구성원으로 간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맥알리스가 지적하듯 교회가 파문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그녀에게 파문은 사실상 공허한 제스처에 불과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맥알리스는 공적 삶의 상당 부분을 교회의 가르침, 곧 남성 사제직, 낙태, 성윤리, 젠더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해 왔다. 그녀는 2021년 문서 「모두를 위한 집(A Home for All)」의 서명자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녀가 여전히 가톨릭 신자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세례를 통해 신자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무력하다는 인상을 준다. 개신교인인 나로서는, 가톨릭 신앙과 인간됨 자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경멸하면서도 여전히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재정의하는 이들이 왜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지 늘 의문스럽다.
오히려 필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지도부가 독재적 폭군이기보다는, 맥알리스 같은 인물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다고 본다. 교회가 그녀가 불평하는 바로 그 ‘요구’를 실제로 행사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이들에게 단호히 대응했다면, 오히려 교회의 신뢰성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맥알리스가 유아 세례의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태도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유아 세례는 학대이지만, 같은 아이를 태중에서 죽이는 것은 인권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하는 건 이것이야말로 기이하지 않은가?
필자 역시 이렇게 말하며 글을 맺고 싶다. 필자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필자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에 가장 중대한 ‘제약’을 가한 사건은, 59년 전 필자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행위, 곧 필자의 잉태였다. 그 역시 필자의 동의 없이 ‘강요된’ 일이었다. 아마 맥알리스도 여기에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녀가 유아 세례에 적용한 그 논리를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까지는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