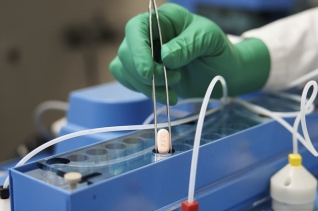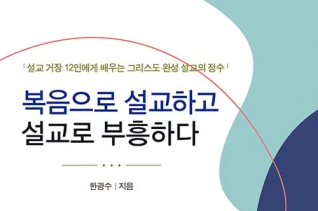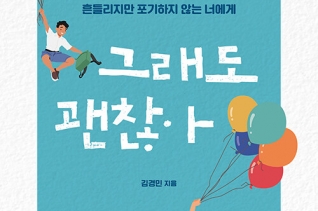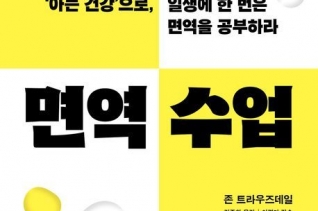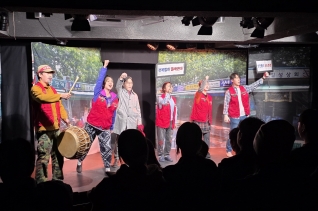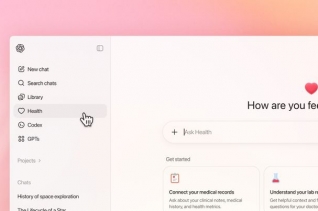학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과 고학력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발표한 ‘2025 고용이슈 봄호’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쉬었음 청년의 규모 변화와 그 특성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쉬었음 청년은 39만3000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59만명으로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집단으로, 구직활동이나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상태의 청년을 지칭한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으로 쉬었음 청년 중 남성, 고졸자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10년간 여성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저연령 여성 비율도 35.0%에서 40.9%로 증가했다.
학력 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2015년 대졸 이상의 비중은 저연령층에서 19.4%, 청년층에서는 54.3%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23.7%, 58.8%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고학력 청년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직 경험 여부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2024년 기준 25~34세 쉬었음 청년 중 ‘구직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에 달했다. 2015년엔 쉬었음 직전 구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였지만, 올해는 29.1%로 떨어졌다.
또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당장 시작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2015년에는 거의 전원이 “그렇다”고 답했던 반면, 2024년에는 응답자의 20.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실제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쉬었음 청년층의 장기 실태도 조사했다. 직업훈련이나 구직급여 종료 이후에도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머무른 31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쉬었음 기간은 평균 22.7개월로 나타났다. 4년 이상 쉰 비율도 10.9%에 달했다. 연령이 높거나 근로경험이 없을수록 쉬었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도 확인됐다.
쉬었음 상태의 지속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1년 이상 쉬고 있는 청년 중 87.7%는 과거 근로 경험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다시 취업하지 못한 비율이 63.0%에 달했다. 연구진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면 다시 미취업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높다”며, 이들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쉬었음 이전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정규직은 38.8%였고 나머지 56.6%는 계약직, 시간제, 프리랜서, 일용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쉬었음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구직 의욕 부족(38.1%)’이 가장 많았고, 교육·자기계발(35.0%), 번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0%) 등이 뒤를 이었다. 쉬는 동안의 주요 활동은 교육·자기계발(55.5%)과 휴식·재충전(52.1%)이었지만, 특별한 활동 없이 지낸 경우도 20.3%에 달했다.
쉬었음 청년들은 대부분 이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58.2%)으로 평가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불안감(71.1%), 자신감 하락(62.5%), 미래 대비 미흡(53.9%) 등 심리적 어려움도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청년 중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68.4%는 1년 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60.9%는 이에 대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69.3%는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조직에 소속되고 싶다고 밝혔다.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임금 및 복지 수준이 높은 일자리’(59.5%)가 1위였고, 이어 ‘일과 삶의 균형’(50.2%), ‘직무 전문성·역량 개발 가능성’(25.6%), ‘공정한 보상 체계’(18.9%), ‘조직 내 소통과 지지’(12.5%), ‘정년 보장 등 안정적 근로환경’(10.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쉬었음 청년 문제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구조적 요인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적 개입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의 연속적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쉬었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인력과 재취업 지원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청년층이 향후 국가 성장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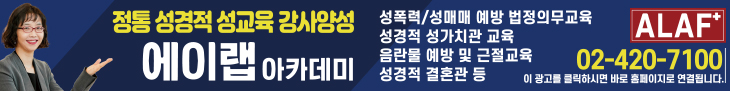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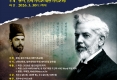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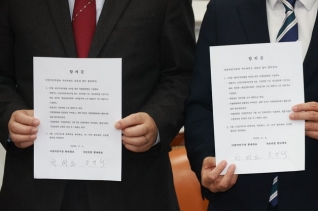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1.30.](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41689/ap-29-2026-01-30.jpg?w=318&h=211&l=42&t=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