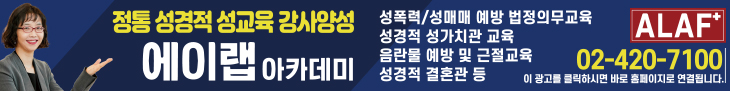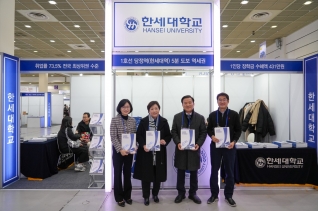‘金光里 들판에서’
-金南亨 兄에게
누우런 벼 익는
黃金 들판에서
허수아비 웃던 일
생각난다.
博月里쪽 제방 둑에서
누가 살짝 웃던 일
생각난다.
용금정(湧金井)* 철철 넘치던
샘물 생각난다.
넓은 벌판
그냥 세례 요한처럼
외치던 사나이 생각 난다.
결국 귀에는
쓰르라미 소리
玉溪宅 울타리가에서
깨 얼어지는 소리.
누가 지금도
해질녘 들판길을 가고 있는가.
* 湧金井:강릉 구정면 금광리에 있는 샘터 이름으로 이 물로 아래 골짜기 농사를 지었다고 함.

이성교 시인(1932-2021)은 강원도 삼척생. 강릉상고 졸업 후 국학대(현 고려대)를 졸업하고 未堂의 추천으로 1956년 『현대문학』으로 문단 데뷔를 했으며, 여의도순복음 교회 장로였다.
성신여대 교수(대학원장, 명예 교수)와 한세대학교 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문화예술인선교회 회장, 한국기독문인협회 회장, 한국기독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문학상(1966), 월탄문학상 (1979), 한국기독교 문학상(1997), 장로문학상(2001), 한국문학상(2005) 등을 수상했다.
문학평론가이기도 했던 이성교 장로의 시는 노골적 프로파겐다적인 신앙시보다 진실함과 강원도 고향을 노래한 시들이 주를 이룬다. 그는 '강원도 촌사람의 시'라는 평이 그리 싫지 않다 했을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천착한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금광리', '언별리'(彦別里) 등도 북한 무장공비 침투 당시 공비들이 칠성산으로 도주하는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들로 시인이 중고등학교 시절 살던 박월리와 아주 가까워 추억의 이야기를 남긴 마을이라 했다. 특별은총(구원은총) 속 일반은총을 강조하는 독특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적 특이성이 그대로 詩心에서도 일부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시온성을 향한 신앙 속 거룩한 '아버지집'( '영원에 대한 소망')은 무언가 기묘한 공명을 일으킨다.
오죽하면 문학평론가 윤병로는 "김소월이 평안도를, 박목월이 경상도를, 서정주가 전라도에 대해 노래했다면 이성교는 강원도에 대해 노래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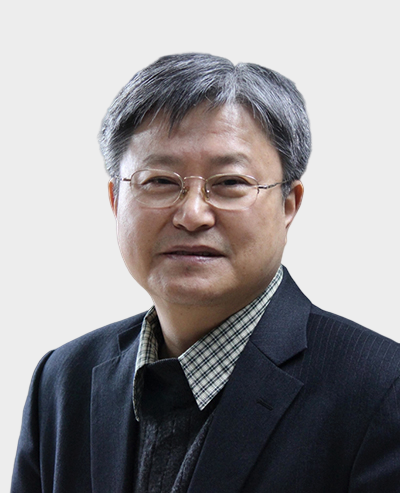
이 시인은 "시인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기 체질이 있다"며 스스로 "<겨울바다>, <보리 필 무렵>, <눈온 날 저녁>, <남행길>, <강원도 바람>, <동해안>, <운두령을 넘으며> 등 시집을 내면서도 (자신의) 시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시를 위한 산문'(고향의 시)에서 고백하고 있다.
또한 시인은 신앙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시를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늘 지면과 간증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진솔하게 드러낸 것처럼, 시도 또한 진실해야 함을 모토로 일관된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듯이 시를 쓸 때도 진지해야 되고, 그 진실이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주제, 구성, 표현이 중요한데 표현에 있어서 더 섬세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성교 장로가 국민일보 이사를 지냈기에, 작년 초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전 국민일보 후원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필자의 친 형님이신 조민영 장로께 이성교 장로에 대해 좀 더 많은 신앙과 학문의 에피소드를 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작가, 시인)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