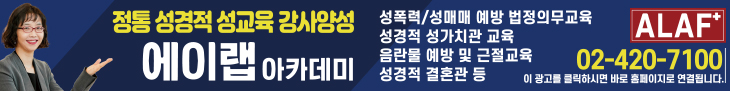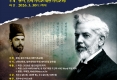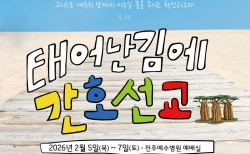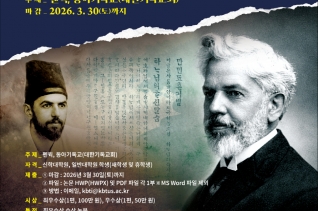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사무국장 이춘성 목사는 최근 복음과 도시에 ‘점치는 그리스도인?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이 목사는 “몇 년 전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그 당시, 서울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니던 한 여자 청년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녀는 연애 실패와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직장을 쉬기로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말했다”고 했다.
이어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나에게 사과를 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목사님, 방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당집에 들러 점을 보고 나왔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 겪은 일이었다. 물론, 점집을 드나드는 청년들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은 타로점을 카드놀이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새해 신문에 나오는 토정비결이나 사주를 통계에 기반한 확률로 간단히 넘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나에게 질문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람은 없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나는 고해성사를 받는 로마가톨릭의 신부가 아니”라며 “개신교 목사로서 나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에 그녀의 죄책감을 해결해 줄 방법은 없었다. 다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줬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녀는 연애의 실패와 직장에서의 부진으로 큰 낙심에 빠져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항상 모범생이자 우등생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실패는 생소한 경험이었다”며 “대학 시절까지의 실패는 노력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회는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불확실했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런 불안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며 “첨단 과학을 전공하고 ‘수재’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 해도 불확실성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낀다. 특히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들은 과연 이 과정을 끝내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늘 불안해한다. 최고 수준의 과학이나 학문조차도 불확실성은 극복해야 할 영원한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존재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며 “돈을 벌어 저축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며, 심지어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한다.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안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다. 내가 모르는 것을 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이 나의 불안한 미래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사람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점(占)을 친다”고 했다.
하지만 “‘占’이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이 행위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신에게 의탁하는 겸손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은 ‘점령하다’ ‘차지하다’ ‘엿보다’ ‘묻다’ ‘불러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며 “이 의미들을 곱씹어 보면, ‘점’은 단순한 불안 해소를 넘어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것은 미래를 점령하고자 하는 욕망의 투영일 뿐이다. 내가 돈을 지불하면 신이 답을 줘야 한다고 여기는 그 태도는, 마치 유명한 투자자와 저녁 한 끼를 위해 수백억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심리와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아울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목적은 미래를 대비하거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신다”고 했다.
아울러 “신앙이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나의 불안과 불확실함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하나님은 스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 그는 산비탈에 서서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군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가 이 어이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성경은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라며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성경 읽기의 목적이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성경은 언제든 무속인의 손에 들린 점괘 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잃고, 단순히 미래의 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책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