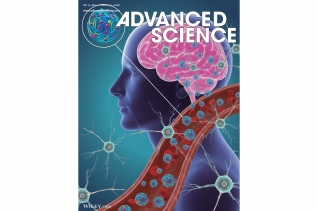신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오랜 시간 의료 선교사로 살아온 저자의 인생 여정과 신앙의 깊이를 담아낸 묵직한 고백록이다. 단순한 회고나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이 책은 과학과 신앙, 인간과 창조, 사랑과 고통이라는 복잡한 사유의 접점을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건네며 묻는다.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곧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물음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설교 내용에 과학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그 황당하고 충격적인 첫인상은, 이후 그를 복음으로부터 한동안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심각한 감염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을 지나며 그는 생의 기적과 신비를 경험했고, 다시금 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사유하게 되었다. 이 고비를 계기로 그는 예수를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료 선교라는 길 위에 자신을 내어놓았다.
이 책은 그가 여러 해 동안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둔 글들을 자연, 생명, 인간, 신앙이라는 주제로 엮은 것이다. 단편적인 글의 나열이 아닌, 저자의 사유의 축적이자 신앙 여정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젊은 세대가 보이는 차가운 반응에 부딪히며, 그는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렌즈로 복음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의 사유는 철학과 과학, 신학과 신앙을 넘나든다. 갈릴레이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자는 인간의 판단력과 신의 판단력 사이의 간극을 강조한다.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던 갈릴레이가 수세기 뒤 교황청으로부터 복권된 사실은,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력으로 신의 심판과 같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원리는 우리가 아는 4차원 인식의 틀을 훨씬 초월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미술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진화하고, 물리학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힌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인간의 한정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하다고 단언한다. ‘창조 과학’이라는 개념 역시 그러한 오류의 연장선상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배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며, 신의 초월적 능력까지 넘보려 하는 과욕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오만이 다시 갈릴레이 시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간절하게 덧붙인다. 신의 위대한 경륜을 인간의 협소한 사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성모독일 수 있다는 우려가 그의 문장 곳곳에 서려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사랑’에 대해 사유를 이어간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품는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 성경이 요구하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실천적 의미를 다시 묻는다. 저자는 이 사랑을 ‘핏줄’이 아니라 ‘의지’로 해야 하는 사랑, 참음과 인내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라고 설명한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첫 조건으로 ‘오래 참음’을 말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풀어낸다. “참는 것은 사랑의 첫 번째 자세이며,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탕자는 돌아올 수 없었다는 설명도 인상 깊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면의 질서와 힘은, 결국 신앙으로부터 비롯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단지 의료 선교사의 회고록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학의 세계를 살아온 이가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건네는 진심어린 지적 안내서이자, 인류의 지식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고뇌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고백문이다. 하나님을 설명하려 들지 않고, 대신 그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이 책은, 독자들에게도 자신만의 신앙적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종교와 과학, 인간과 창조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주제들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이 책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길 것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