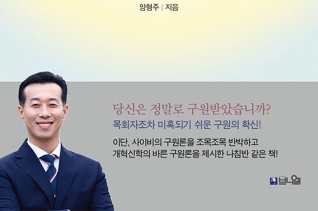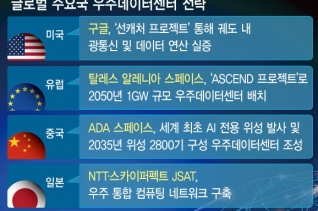심뇌혈관질환이라는 용어 탄생

멀고 먼 남미에서 교포 여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찾아온 적이 있다.
"하루에 7~8번 정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요. 식사를 준비하다가 식탁 위로, 화장실에서는 변기 틈새로 처박혀 있기도 했고요.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와 하버드대병원 등에도 가봤는데 간질파가 약간 있는 거 같기도 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 머리로 향하는 혈액량이 정상인보다 2분의 1도 되지 않게 나왔다. 다른 검사에서도 정상을 훨씬 밑도는 수치가 나왔다. 치료를 시작하고 12일째, 치료로는 6회차가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본인이 발견한 결과를 이야기했다. 치료한 첫날부터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지만 7, 8년을 고생한 바가 있어 좀 더 관찰한 후 말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28회의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죽는 날까지 원장님을 잊지 못할 거라며 이별을 고했다.
중풍(뇌졸중, stroke)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거나 잘 가지 못하게 된 병을 말한다. 중풍은 '뇌혈관의 좁아짐(협착)'에서 시작한다. 사망하거나 의식 상실, 반신불수, 언어장애 등이 주 증상이다.
뇌혈관의 길이는 약 2400㎞로 적도를 기준으로 한 지구 둘레의 50분의 3 정도이다. 서울~부산을 20여 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긴 것이 어딘가에서 좁아졌다는 거다.
사람에게는 유전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암이나 중풍, 당뇨 등에 잘 걸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영국 왕실처럼 혈우병 유전력(遺傳歷) 때문에 남자가 드물어 여왕이 많은 경우도 있다. 기나긴 뇌혈관도 유전적 차이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두께와 폭으로 돼 있을 수는 없다. 주변보다 얇은 곳이 있게 마련이다.
뇌강(腦腔) 내의 문제로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면 이곳이 급소가 된다. 다른 부분보다 많이 눌려 쉽게 좁아진다. 뇌혈관이 좁아지면 초기에는 베르누이 법칙에 의해 혈액의 속도가 빨라져, 뇌 조직에 도달하는 혈액의 총량이 줄지 않는다. 바로 위험에 빠지지는 않는 것이다.
심장도 혈액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를 높여 펌프질한다. 이런 시도들로 좁아져 있던 혈관이 원래대로 넓어지면 다행이지만, 한번 좁아진 혈관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혈관이 좁아진다고 바로 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다.
능력으로 보면 뇌는 무한에 가까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공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뇌 속의 공간면적이 제한된 데다 확장의 여유로움도 매우 작기 때문이다. 머리뼈 조합은 최대로 늘어나봐야 1~2㎜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로 말미암아 뇌 안의 문제는 바로 뇌혈관 압박으로 이어진다.
혈관 압박으로 발생하는 혈액 공급 부족은 산소 공급을 최저치 이하로 떨어뜨리고 몸에 대한 뇌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때 몸은 SOS 신호를 보낸다. 기절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짐이 반복되면, 뇌는 중풍이 임박해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지한다. 이 시점에 이르면 환자는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라져 심한 두려움에 빠진다. 중풍 환자의 우울증은 이렇게 생겨난다.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심장이다. 뇌혈관이 좁아졌을 때 타고난 심장의 강약에 따라 중풍의 방향도 달라진다. 심장이 강한 부류의 사람은 심장의 강한 펌핑 때문에 혈관의 얇은 곳이 팽창해 동맥류(動脈瘤, aneurysm)가 생긴다. 동맥류의 '류(瘤)'자는 보기 힘든 한자인데, 뜻은 '혹'이다. 병적으로 불거져 나온 살덩어리를 지칭하는 바로 그 혹이다.
혈관벽에 혹이 생긴 것처럼 일부가 볼록해지면서 팽창하여 그 부분의 동맥 혈관이 얇아지는 것이 동맥류이다. 뇌혈관에 동맥류가 생기면, 혈관이 얇아진 부분이 터짐으로써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약한 부류의 사람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부담이 심해져 심장이 더 약해져버린다. 심장 펌프질의 강도가 저하되면 좁아진 곳이 더욱 수축되어 '뇌경색'이 일어난다.
필자는 2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설명을 했는데, 많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이해되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심뇌혈관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정착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풍 후(後)' 처리 기술은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은 인식의 오류가 있다. '쓰러져야 중풍'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늦다.
쓰러진 후 중풍으로 확진해 후처리를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쓰러져야 중풍'이라는 인식은 아집이다.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숨어 있는 지뢰다.
「통뇌법 혁명:중풍 비염 꼭 걸려야 하나요?」중에서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