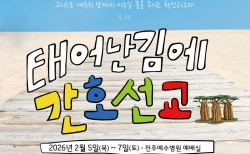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타렉 오스만의 기고글인 ‘왜 기독교인들이 통합된 시리아의 열쇠가 될 수 있는가’(Why Christians may be the key to a united Syria)를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타렉 오스만(Tarek Othman)은 시리아계 미국인 기업가이자 시민운동가로, 시리아계 미국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합(SAAPP, Syrian American Alliance for Peace and Prosperity)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시리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를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과도기 초기에 현지의 종교 지도자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교류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바샤르 알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도피하고 내전이 종식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리아는 여전히 불안정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과도 정부는 국가 기관을 재건하고, 외교 관계를 재편하며,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최근 쿠르드 지역을 둘러싼 긴장은 재통합 과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지점에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 자유의 공간이 서서히 열리고 있으며, 유지되고 있다.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소수 집단일 뿐 아니라 시민적 통합을 지지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종파보다 시민권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증거다.
이 때문에 최근 성탄절 시즌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단순한 관용을 넘어, 최근 시리아 역사에서 보기 드문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곧 ‘공적 신뢰’였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함께 거리에서 축하했고, 대통령궁 정문에는 크리스마스트리까지 세워졌다. 많은 이들은 이를 국가적 재생을 암시하는 작지만 의도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12월 25일과 1월 7일(정교회 성탄절)을 잇는 기간 동안, 시리아는 단순한 축제 장면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이 휴일은 과도기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공적 다원성이 버텨낼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이었다. 외부 서사 속에서 종종 주변화되거나 영원한 피해자로만 묘사되어 온 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이 순간은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은 시리아의 미래에서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리아에서 기독교는 국가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부터, 유프라테스 강변 두라-에우로포스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가정교회 유적까지 그 뿌리는 깊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정교회, 아시리아·시리아 교회 공동체,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마론파 등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문화와 학문, 공적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들은 알레포에서 아랍어 인쇄를 선도했고, 초기 근대 시리아 민족주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유산은 오늘날까지 시리아 정체성의 일부로 남아 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아사드의 잔혹한 독재 아래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맥락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는 한 허용된 것이었으며, 진정한 참여가 아닌 순응을 요구하는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독교인들 역시 다른 시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대치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 공적 신앙은 가능했지만, 공적 자유는 불가능했다. 체제 변화에 대한 희망은 외쳐야 할 것이 아니라 속삭여야 할 것이었다.
14년에 걸친 끔찍한 내전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심화시켰다.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훼손되었고, 공동체는 흩어졌으며, 두려움은 일상이 되었다. 독립 언론들은 분쟁 속에서 기독교 민간인과 수백 년 된 종교 유적들이 공격당한 사례들을 기록했다.
오늘날 시리아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겪은 고난만이 아니라, 아사드 정권이 2024년 12월 완전히 붕괴한 이후 그들이 시리아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있는 방향에 있다. 일부에서는 분권화, 연방제, 혹은 민족·종교별 분할을 주장하지만, 시리아 내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관되게 통합된 국가를 강조해 왔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시민권이다.
이 선택은 시리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과 다른 수도들에서 중동의 기독교 소수자들은 종종 소수자 안전의 척도로 여겨진다. 미국 의원들이 시리아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도 이것이다.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난해 미 의회 대표단이 구 다마스쿠스, 세드나야, 말룰라를 방문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들은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었다. 신중한 낙관, 정치 변화에 대한 지지, 분할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아사드 정권에 부과되었던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시리아인들이 집과 생계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해외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 만약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이나 고립을 택했다면, 제재 장기화, 더 깊은 고립, 혹은 ‘소수자 보호’라는 이름의 분열 논리를 강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분열보다 통합, 분리보다 동등한 시민권, 두려움보다 희망이었다.
이 점은 중요하다. 시리아가 종파적 분열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반박이 되며, 국경 재편을 노리는 외부 이해관계를 약화시키고, 재건과 주권, 그리고 공동의 시민적 미래에 대한 논거를 강화한다.
기독교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성탄절을 축하하는 모습 자체는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웠던 것은 그것이 담고 있던 의미였다. 그것은 살 가치 있는 시리아는 함께 세워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세워질 수 없다는 조용하지만 공적인 선언이었다.
대통령궁 앞의 크리스마스트리가 혁명의 성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과 새로운 국가가 함께 걸고 있는 공개적인 내기였다. 다음 시리아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신앙으로 소속이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라, 신앙과 무관하게 소속이 보장되는 나라 말이다. 이 내기는 연약하다. 그러나 모든 배경의 시리아인들에게, 두려움 대신 통합을 선택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믿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