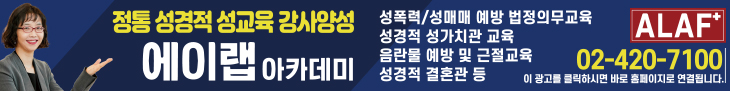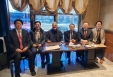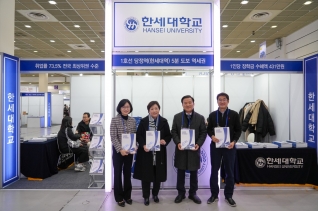VII.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구체적인 역사성

“십자가형은 결코 피흘림이 없는 처형 방법이었다”는 스토아적 해석은 당시 로마시대의 처형 방법에 맞지 않는 해석이요, 신약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과도 배치된다.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감정과 덕성(德性)에 대한 설교에서 십자가를 지혜자의 침착과 덕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스토아적 해석에서 십자가형이란 구체적인 사실 아닌 하나의 은유(隱喩)가 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십자가란 지혜자가 죽음으로써 자유로울 수 있는 고통에 대한 본보기, 즉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육체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해석은 십자가형을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가 당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 은유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20세기 초 불트만 류(類)의 영지주의적 주장과 유사한 은유철학적 이론이다. 불트만의 주장은 약간 수정된 형태이기는 하나 그의 제자들인 핸헨(Haenchen), 개제만(Käsemann), 슈미탈(Schmitals), 푹스(Fuchs), 보른캄(Bornkamm), 빌하우어(Vielhauer) 그리고 브란덴브르거(Brandenburger) 등에 나타난다. 따라서 불트만에 의하면 역사적 예수에게 남아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역사성을 부인한 고대 이방 신화라는 껍데기뿐이다. 불트만은 역사적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하여 기독교 이전의 영지주의적 구원자 신화개념에서 찾아 극단적인 왜곡을 하면서 역사적 교회에 심각한 영적 신앙적 피해를 입혔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처형당하는 자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 뿐 아니라 처벌의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던 채찍질은 많은 처형당하는 자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다. 세네카가 언급하는 바 같이 예수는 몸이 너무 허약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을 처형 장소까지 운반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빠르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준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2004년에 상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Passion of Jesus Christ)이라는 기독교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고통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감각적이며, 수난적인 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십자가형의 시대사적인 연구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형이 하나의 픽션이나 은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통은 종교적 낭만으로 명상될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미국 뉴브른위크 신학대(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차재승은 2014년 우리 말로 출판한, 화란 자유대 신학부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7인의 십자가 사상. 십자가 그 자체로부터 넘치는 십자가로』(The Cross as such and the Cross Overflowing.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에서 십자가의 객관적 사실 자체와 우리에게 미치는 십자가의 주관적 사실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실성, 인간 구원의 주체이심을 드러내고, 후자는 인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함께 죽음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포함됨)과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우리를 죽임으로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함)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저자 차재승은 “넘치는 십자가”의 일곱가지 모델로서 안셀무스의 충족론, 루터의 교환설, 오리게네스의 희생설, 캠벨의 회개론, 이레네우스의 총괄갱신론, 판 드 베이크의 나눔과 짊어짐론, 칼빈의 대속론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 십자가 그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로서 신비 속에 있으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신앙의 역사 과정에서 무한히 산출된다면서 7개의 넘치는 십자가 모델을 조직신학적으로 밝힌 점은 저자의 공헌이다.
이 저서에서 아쉬운 점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지 유한한 인간을 대신한 것으로 나눔과 짊어짐이란 차원으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죄(하나님에 대항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와 죄의 대속으로 행해졌다는 십자가의 핵심 사상이 현대주의적 대리(substitution) 개념에 가리어져 소홀히 취급된 점이다. (계속)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