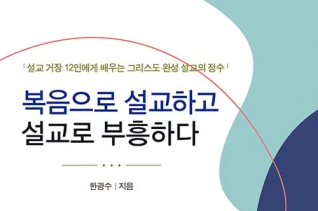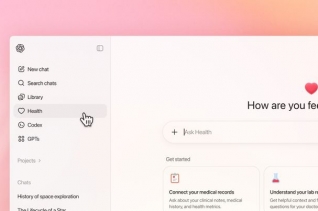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면서 의대생 복귀 시한(3월)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를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에 계속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소속 하은진 신경외과 및 중환자의학과 교수, 오주환 국제보건정책 교수, 한세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17일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교수들은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메디스태프, 의료 관련 기사 댓글, 박단의 페이스북 글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 우리가 알던 제자와 후배들이 맞는지, 우리 곁에 진정한 동료들이 남아 있는지 두려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로 남을 수 없다"며 "여러분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했다. 남은 것은 탕핑(躺平·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과 무조건적인 반대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라며 "의사 면허는 사회가 의료 행위를 독점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그 희소성을 인정받으며 가치도 부여받아 왔다. 하지만 사회가 의료계의 독점 구조를 허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공공성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처럼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이며, 결국 사회는 독점적 의료 권한을 다른 직역에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의사의 전문가 정신은 의사의 이익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공포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대가 미워도 우리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부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의료계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라며 "남수단과 시리아 내전처럼 극단적 대립과 증오는 결국 나라를 파괴했고, 모두를 무너뜨렸다. 그런 승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고, 의료계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달리, 의사들은 책무를 다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사회와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근로 환경도 지속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협력하며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반대만을 외치며 의료 독점권을 잃고 도태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급하게 나오면 우리는 품격 있게 대응한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미셸 오바마의 말을 되새겨야 한다"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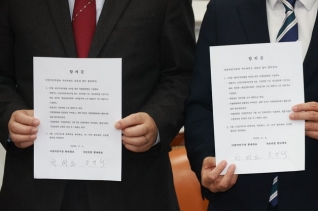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1.30.](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41689/ap-29-2026-01-30.jpg?w=318&h=211&l=42&t=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