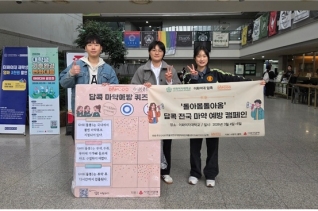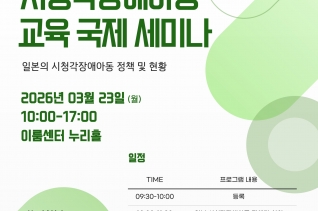포스트휴먼, 인간을 말하다…

* 인간의 실존, 미적존재와 윤리적 존재
키에르케고르 (Søren Kierkegaard)는 인간의 실존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미적 존재, 윤리적 존재, 종교적 존재이다. 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것들, 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불변의 진리처럼 다가온다.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고르거나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도 ‘맛집’을 추천받는다. 맛없는 집을 찾아가 갈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음식 뿐만 아니라 입는 옷이나 사는 집 그리고 운동화를 하나 골라도,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아름다운 것을 찾는다. 인간은 누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인간의 무한한 욕구는 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와 가치를 가진 것들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런 유한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른다.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높은 이유는 유한하고 희귀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돌멩이들처럼 여기저기 뒹굴고 다니면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유한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 무한성을 지닌 욕구와 유한한 재화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소유욕이 유한한 자원과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유한한 가치들을 얻기 위해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 모두가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투쟁하고 싸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한한 재화와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결국 모두가 희생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 존재’를 요청하게 된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성찰을 요구하는 존재’가 된다. 무엇보다 윤리적 존재는 무한한 욕망에 비해 유한한 재화를 인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존재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가치보다 공동체 전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간다.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단계가 바로 윤리적 존재에서 이루어진다.
윤리적 존재는 타자를 배려하고 공동체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고민하는 존재이다. 무조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미적 단계를 넘어서 공동체에 필요한 ‘옳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룬다. ‘좋은 것’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윤리적 존재이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그 아름다움은 미(美)가 아니라 선(善)이라는 것이다. 윤리적 존재는 선한 존재를 말한다. 미(美)에서 선(善)을 추구하는 존재는 또 다른 실존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종교적 존재의 요청이다.
* 종교적 존재, ‘신 앞에서의 단독자’…
끝으로 종교적 실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관문을 거치는 과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실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 는 소크라테스의 삼단논법에 등장하는 문구처럼 모든 실존은 생(生)을 마감한다. 자연에 속한 모든 생명체는 결국 죽음이라는 실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실존에서 자신을 또 다시 발견한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했던 존재,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존재를 거쳐 마지막 실존인 죽음의 단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 만약 ‘죽음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죽음이 가까울 때, 가장 소중했던 것들과의 이별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지난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무의미하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된다. 내가 소유했던 것들과의 이별이 불가피하다. 그래서일까? 이제 우리는 서서히 ‘신(神) 앞에서 단독자’가 된다. 신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신에게 ‘나는 누구이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죽음은 또 다른 내세를 향한 실존의 준비 단계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내가 갈 또 다른 세계관을 꿈꾸고 신앙의 힘으로 이 실존을 극복한다. 죽음이라는 것, 살아있는 것과의 단절 그러나 또 다른 생명과 삶과의 연결을 우리는 경험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된다. 그 이후 우리는 세상과의 단절 그러나 또 다른 세상과의 연결이 시작된다.
인간의 실존은 세 단계를 거쳐 마감한다. 우리의 실존은 여기에서 마친다. 죽음이라는 실존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에 대해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 공각기동대(Ghost In The Shell), 현실로
우리 앞에는 과학 기술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유전자 편집과 줄기세포로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기계를 합성하여 사이보그와 같은 존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신경계에 기계를 연결하여 몸(body)과 기계가 하나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실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스칼렛 요한슨이 출현한 2017년 개봉작 영화 <공각기동대>는 인간과 기계의 신경계를 연결하여 마치 로봇이 인간이 되는 ‘휴머노이드(humanoid)’를 그린다. 영화 속의 주인공 스칼렛 요한슨과 등장 인물들은 인간의 신경계와 기계를 연결하여 자신들의 의지대로 기계로 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의 이야기는 이젠 더 이상 공상의 소설에 머물러 있지 않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소피아’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소피아 로봇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에서 소피아는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1984년에 개봉된 영화 <터미네이터>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당시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영화의 현실성에 대해 낙관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을 예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영화가 점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서서히 인류의 무대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고 있다. <계속>
김광연 교수(숭실대학교)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