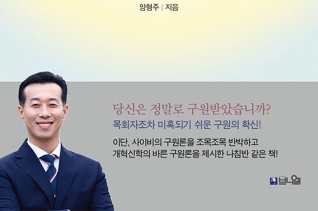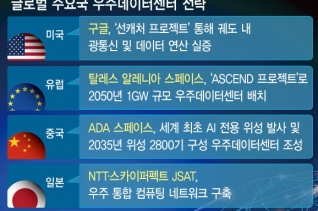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 물고기 같이 바다 밑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도 없다. 사자마냥 저 넓고 푸른 초원을 신나게 뛰어다니지도 못한다.
사람은 그래서 춤을 춘다. 자신의 몸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의 또다른 표현인 셈이다.
'현대 무용의 혁명가'로 통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슈(1940~2009)의 '풀 문(Full Moon)'은 춤의 이런 속성을 극대화했다.
현대 무용은 무용 중에서 가장 전위적이다. 1973년 부퍼탈 탄츠테아터의 수장이 된 바우슈의 무용 작품은 특히 그렇다. 발레처럼 정형화 또는 형식화된 움직임을 내세우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구부리고, 돌고, 예측할 수 없는 몸의 향연을 선보인다.
바우슈는 탄츠 테아터(댄스 시어터)라는 새로운 장르를 발전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허물고, 현대 무용의 어법을 무너뜨렸다. 특정한 이야기가 있다기보다 내러티브가 끊임없이 분절된다. 대신 그 자리에 있는 배우, 그의 몸짓이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풀 문'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수렴된다. 배우들 움직임의 의미가 쉽게 읽히지 않는다. 딱히 줄거리는 없지만 무용수들이 몸의 화학 작용에 관심을 쏟는 1막은 만남, 떼어놓으려는 주변 무용수의 방해에도 서로 끌어안고 동선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은 이별을 연상케 한다. 하지만 무용수들의 절규에 찬 몸짓을 보고 있으면 의미를 한정하는 규정은 무의미해진다. 체격과 신장이 다른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몸짓의 조화는 다양한 리듬감을 만들어내며 역시 극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다.
중간 중간 우리 말이 나오는데 반갑기도 하지만 무용수들이 내뱉는 대사와 흥얼거리는 노래들의 맥락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감동이 이는 것은 무용수들의 격렬한 몸짓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은 무대 위에 솟아오른 듯 자리한 거대한 바위 옆에서 폭우처럼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모습에서 내 욕망이 물처럼 분출됨을 느낀다.
공연의 제목인 '풀 문', 즉 보름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수준이다. 차오름의 절정인 보름달은 사람의 감성을 가장 건드리는 달이기도 하다. 그렇게 인간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바우슈가 제목을 '풀 문'으로 정한 이유는 이런 해석만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나 가득 차 오르는 감정선은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커다란 바위 주위로 발목까지 찰랑거리는 물이 차오르면, 황홀경과 함께 불안이 엄습한다. 역시나 쉽게 해석하고 정의할 수 없는 인생과 우리의 내면이 바로 무대 위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렇게 바우슈가 꿈꾸는 자연과의 합일이 이뤄진다.
국내에 선보이는 피나 바우슈 무용단의 7번째 작품이며 '풀 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2012년 빔 벤더스(69)의 3D 영화 '피나'를 통해 알려진 작품이다.
28~31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공연 티켓은 매진됐다. 러닝타임 2시간30분.
◇피나 바우슈는?
2009년 6월 암 선고를 받은 지 5일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탄츠 테아터'라는 새로운 장르를 발전시키며 20세기 현대무용의 어법을 바꿨다.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허물었다. 죽어서도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기념, 현지에서 10편이 연속으로 공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용단 창단 40주년 기념 페스티벌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