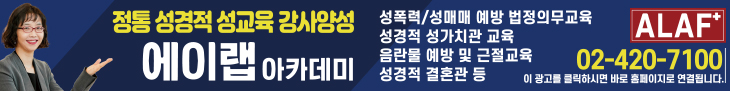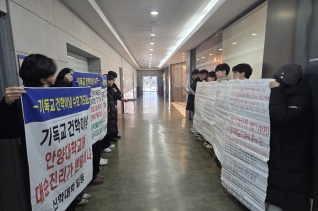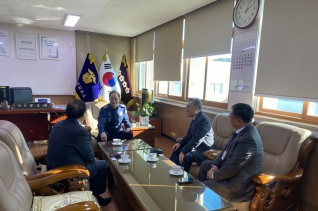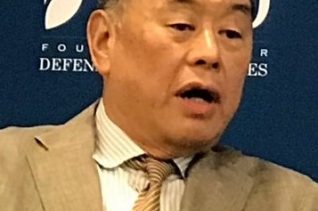VIII. 마지막 희생양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희생제물

서구에서는 포스트모던 조류(潮流)가 지배하는 오늘날 정통 기독교를 복권시키는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기 희생(self-oblation), 형벌을 엄한 사랑(tough love)으로 이해한다. 지라르는 천명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폭력의 기초적 메카니즘을 계시한다.” “예수는 희생양(scapegoat)이지만 희생제물(sacrifice)은 아니다.” “어느 복음서들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하나의 희생제사로 정의되지 않는다.” 지라르에 의하면 예수의 죽음은 지속되는 희생제사(sacrificing)를 종식시킴으로 모든 지속되는 희생양 만들기(scapegoating)를 종식시킨다.
지라르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구약 레위기적인 희생제의에 대해서도 예수는 마지막 희생제물(the final sacrifice)이기에 신약 히브리서는 더 이상의 희생제사(sacrificing)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신화 속에서 맹위를 떨치는 폭력의 전염을 폭로함으로써 신화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수 수난 이야기에서 예수는 자신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보여주면서 (비난해야 한다는) 이 의무를 ‘무효화시키고’ ‘없애버렸다’.” 세계종교들의 공통적인 신들(gods)이 희생제사와 폭력의 신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God)은 희생제사와 폭력의 신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엄한 사랑과 자비의 신이다.
인문학자요 종교문화학자로서 지라르는 형벌 대속적 개념을 인류학적 희생 개념을 빌려 해석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희생 개념은 성경적 하나님의 독특한 화해와 사랑 개념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레위기적인 희생제사 개념을 강하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에는 폭력의 개념보다는 죄의 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구약적 신약적 대속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신학자 이상으로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의 독특성이 여태까지 종교문화적 인류학적 희생개념인 은폐된 희생제사로서의 폭력행위를 폭로함으로써 이러한 희생제사에 대한 비판을 가했으며, 종말을 가져왔다고 해석하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에 공헌을 하고 있다. 그리고 테드 피터스(Ted Peters)가 말하듯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수의 “최종적인 희생제사”와 지라르가 말하는 예수의 “최종적인 희생양”은 기능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를 ”최종적인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속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지라르는 희생제사 개념을 신들의 폭력행위라고 거부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강조했으나, 신학자 슈바거와의 대화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마지막 희생제사라는 십자가의 역설을 인정한다.
판넨베르그는 지라르가 에수의 죽음을 주로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라르의 저서들은” “대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Wolfhart Pannenberg,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94, 422.) 예수의 십자가로 창세 이후로 희생제사가 수렴되고, 폭로되고, 전복되고 그리고 내부로부터 치유된다.
지라르는 레오폴드 루카스 시상식에서 “복음서는 신화의 죽음이다”고 역설했다. 지라르는 이사야 53장을 자신의 희생양 이론 속에 자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이 고난받는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원형으로 이해하여, 이 희생양인 고난 받는 종인 희생양을 에워싸는 군중들을 본다. “십자가의 승리는 폭력의 희생양 순환에 대항한 사랑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선언하는 자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scapegoat mechanism) 사상은 “현대신학이 도외시한 기독교 속죄론의 중요성을 종교인류학적으로 다시 환기시킨 점에서 기독교 복음의 유일한 독특성을 드러내었다.”
희생양 메카니즘은 역병, 전쟁과 같이 사회적 차이들을 지워 버리는 문화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작동된다. 그 위기의 책임자로서 소수자들이 지목되고 피부색, 질병, 광기 그리고 신분 등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집단이 희생양으로 몰린다. 예로,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조선인이 약탈 방화를 했다더라”.. 등의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의 군경과 민간인으로 조직된 자경단들이 6천명의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참상이 발생하였고 일본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가담, 주장, 묵인하였다. 지라르의 희생양 메카니즘 이론은 현대사회에서의 집단적 폭력의 광기(狂氣)를 잘 설명해 준다(Ted Peters, Sin: Radical Evil in Soul and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94, 184 f.) (계속)
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