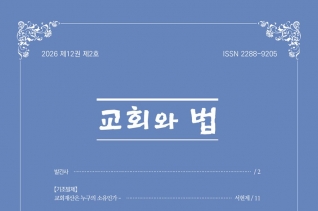최근에 우리 대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주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케냐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썼을 때 영수증을 안 챙기는 습관이다. 이것은 학교 행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또 사람들에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고 생각해보니 어렵게 살고 각박하게 살다보니 시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오랫동안 안 써온 것 같다. 벽시계가 있긴 한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몇 번 겪다보니 신경질도 나서 혹시 시간 맞춘다는 punctual이라는 단어를 아느냐라고 물으니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오면 오는 것이고, 늦게 오는 것에 부담을 전혀 못 느끼고 또 안 느끼는 것이다. 몇 시에 간다라고 얘기해 놓으면 그날 내로 가면 된다는 생각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10시에 약속해 놓고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라고 짜증내면 ‘기다려봐 곧 올거야’. 그리고 오후 두 시쯤에 나타나면 ‘봐, 오 잖아’라고 아무일 없다는 듯한 표정이다. 나같이 시간 지키기에 예민한 사람은 함께 일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결국은 이방인인 우리가 지고 만다. 그냥 수긍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견디지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다.
영수증을 안 챙기는 것도 오랜 습관인데 그렇게 할 물건도 사본 일이 없고, 사더라도 영수증을 굳이 받아와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이해하지만 우리 학교를 후원하는 사람들, 특히 멜빈대학교 이사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도 있다. 어쩌면 나나 학교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관계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현재의 당면 과제이다. 한 번 만나면 영원히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 순간이 다가왔다.
멜빈 목사님께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된 적이 있었다. 사역을 오래하시다보니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신 것 같다. 나는 그 당시 우리 연구소의 스태프들은 안 헤어지고 영원히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누군가 떠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역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런 저런 개인사정으로 떠나는 것은 기꺼이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게 되었다. 멜빈 목사님께서도 이런 경우를 내게 얘기하신 것이다.
사실, 결정에 있어 지나치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다. 며느리가 조금 뭘 잘못했다고 헤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즉 홧김에, 순간적인 판단에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만 매사를 결정하는 이들도 있다. 작은 일에 이런 저런 실수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중요한 일에서 이런 충동적인, 마치 배고프니 폭식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충동이냐 판단이냐, 또는 비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