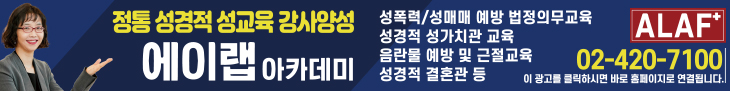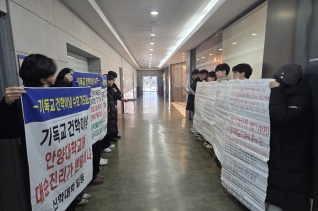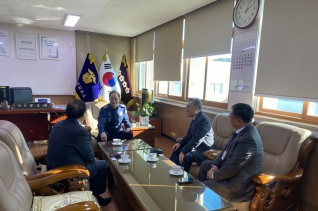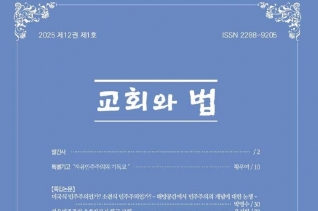지난 6일 현충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념일이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불리게 된 것도 현충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채 2년도 안 돼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전사하고 1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생을 달리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이 현충일이다.
현충일이 국가 추모일로 제정된 건 이승만 정부 때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3년이 지나 전후 복구가 한창이던 1956년 4월에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했다. 그 현충기념일이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지금의 현충일로 공식 개칭되었고, 1982년 5월에 법정기념일로 안착했다.
매년 6월 6일,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현충일 추념식엔 현직 대통령과 3부 요인, 여야 대표 등 모두가 참석하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처음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식은 정부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따로 백범기념관에서 진행해 ‘반쪽’ 기념식이란 말이 나왔다. 하지만 현충일만은 분란이나 갈등과 거리가 멀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일은 보수와 진보, 이념과 세대를 초월해 ‘애국’이란 공통분모를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행사가 현충일 추념식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는 특별히 6.25 국군참전용사 12만1천723명을 상징하는 고유번호(1∼121723번)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 태극기 배지는 국산 명품 자주포인 K-9의 제작 과정에서 나온 유철을 활용해 국군참전용사 유골함에 태극기를 도포한 형태로 디자인해 제작됐다고 한다.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국군참전용사들을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미의 이 캠페인이 국민들 가운데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3년 1개월을 끌었다. 그 기간 동안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희생과 대가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처참했다.
그런데 6.25 전쟁에서 희생한 사람이 우리 국군과 국민만이 아니었다. 유엔의 결의로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든 미국 등 16개 참전국 군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나라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 중에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고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6·25전쟁에서 참전한 미군의 수는 179만여 명에 이르고 그 중 국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미군이 3만7천여 명, 부상자가 9만2천여 명에 달한다. 아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자가 3천7백여 명이나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6.25 전쟁이 끝난 72년간 우리나라를 지키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전사한 미군이 103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채 석 달도 안 된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미군이 반드시 한국 땅에 주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미국 의회에 강력히 요청해 이 조약을 성사시켰다. 이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을 막아내고 오늘까지 평화 속에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다.
미군이 이 땅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만 수행한 건 아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각종 경제적 원조를 해 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군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국제사회의 믿음을 바탕으로 안정 속에 경제 부훙을 이룰 수 있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있었지만 주한미군이 군사 안보 위협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새에덴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국내외 참전 용사를 초청해 보은행사를 갖는 건 나라를 지켜준 이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다. 일부 교회가 그 고마운 마음을 참전용사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일부 교회가 명맥을 잇는 수준일 뿐 한국교회에서조차 점차 잊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국군 등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건 후세인 우리의 당연한 도리다. 하지만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유엔군과 전후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주한미군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또한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에 속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미군과 ‘한미동맹’의 지대한 역할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