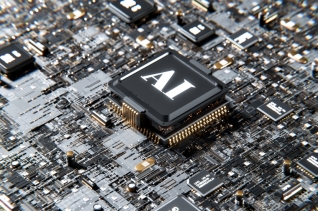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되물으신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비유는 흔히 영적·도덕적 교훈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법과 기독교 윤리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이 세상에는 악과 위험이 넘쳐난다. 그로인해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묻는다. “돕다가 더 다치게 하면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율법교사가 던졌던 질문과 닮아 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질문, 법의 안전지대를 찾으려는 질문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은 냉혹하지만, 당시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돕지 않았다고 정죄받지 않는 것이 껍데기 율법의 구조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법적으로 허용되는 무관심’을 드러내시며, 이웃 사랑을 법의 경계 밖으로 확장시키신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의 참 정신인 자기희생 위에 이루어야 할 이웃 사랑의 모습을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을 들어 보여주신 것이다.
이 장면은 2천 년 전 유대 사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법제도와도 맞닿아 있다. 흔히 구미 각국에는 ‘Good Samaritan Law’, 즉 선의로 응급구조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에는 “누구든지 선의로 남을 도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의료법 등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인 면책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돕다가 다치게 하면 정말 처벌받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처벌되지는 않는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응급상황에서 비전문가가 선의로 도움을 준 경우, 법원은 ‘완벽한 처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보통의 주의로 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민사책임의 문턱은 더 낮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응급성, 무상성, 선의, 상황의 급박성이 강하게 고려된다. 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돕다가 곧바로 범죄자가 된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즉 Good Samaritan Law의 내용도 미국과 유럽은 다르다. 미국은 일반 시민에게 구조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게 폭넓은 면책을 제공한다. “돕고 싶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기 위험 없이 가능한 구조조차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 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묻는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한국은 일반적 구조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행에 대한 포괄적 면책도 제공하지 않는다. “돕지 않아도 처벌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도왔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가장 소극적인 구조다. 이는 질서를 중시하는 법문화의 선택이지만, 자발적인 이웃 사랑을 제도적으로 북돋우는 데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반복되어 왔다.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되던 1990년대, 대형 재난과 사고를 겪은 2010년대마다 “사람들은 왜 돕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끝내 일반적인 Good Samaritan Law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책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마리아인은 법적 보호를 기대하지 않았고, 위험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웃이 되기를 선택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는 국가의 입법을 요구하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이다.
국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강제할 수 없다. 법은 사랑을 명령하지 못한다. 다만 사랑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교회는 법이 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묻기 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가이사의 법보다 한 걸음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간극이야말로, 교회가 설 자리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