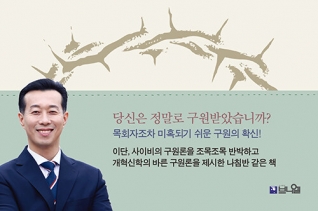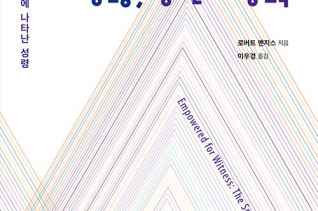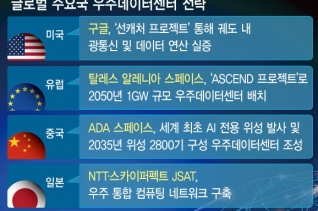(타클로반=로이터/뉴시스) 태풍이 닥치기 이틀 전, 공무원들은 확성기를 들고 시내 곳곳을 돌면서 고지대로 옮기거나 대피소로 피하라고 사정했다. 국영 텔레비젼과 라디오도 이를 대대적으로 방송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났고, 어떤 사람은 안 떠났다.
주민들은 이 열대 국가를 괴롭혀 온 태풍에 항용 곁따라 오는 강풍, 홍수 및 진흙 사태에 철통 같은 대비를 갖췄다. 그러나 22만 명 주민 중 단 한 명도 태풍 하이옌이 일으켜 곧장 이들에게 쏟아내는 6m 높이의 물벼락을 예상하지도, 대비하지도 않았다.
"다들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해안에서 500m 넘게 떨어진 한 칸 짜리 집에 그냥 머물렀던 린다 마이에는 말했다. 그녀는 경고를 들었으나 그녀가 살고 있는 타클로반 동네는 "61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물이 범람한 적이 없었다."
그녀 가족들은 통조림, 식수, 양초를 쌓아 쟁였으며 텔레비젼, 랩탑 및 가전 제품들을 플라스틱 백으로 씌워 놨다. 그러나 그녀의 16살 난 딸 알렉사 웅이 울부짖는 바람과 폭우 소리에 금요일 새벽 5시에 잠이 깨게 될 쯤 하이옌이 예사 폭풍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집이 흔들렸다. 목조의 문틀과 창틀이 저절로 쾅쾅거렸다. 창문 틈으로 딸이 밖을 내다보니 문과 방충망들이 휘날리면서 땅에 떨어져 박살나고 있었다.
동네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판이였다.
알렉사가 엄마와 남동생 손을 잡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자 물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이나 하는 것처럼 쏟아져 들어와 문을 반토막 냈고 순식간에 방에 물이 무릎 깊이까지 찼다. 몇 분 후 가슴 깊이가 됐다.
이제, 식구들은 식탁 위에 올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 천장을 응시하던 알렉사의 동생 빅토르 빈센트는 물이 차오르면서 귀중한 공기의 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낀다. 도망가야 한다. 그러나 엄마는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알렉사는 휴대폰을 봤다. 아침 8시30분. 이동통신사의 로고가 원을 가로지르는 큰 선 그림으로 바꿔져 있다.
"그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알렉사는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였다."
물은 계속 차오른다.
알렉사 식구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은 알렉사의 가슴, 엄마의 턱까지 올라왔다.
이때까지 그들은 이 홍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까지 어떤 태풍도 홍수 같은 걸 일으킨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입으로 간신히 물을 튀겨냈다. 짠맛이 났다. 경황 중에 이들은 알아챘다; 바다에서 온 물이구나.
물고기가 알렉사의 등 뒤에서 펄럭거렸다. 그녀는 기겁을 했다.
이들 가족은 마지막 한계선에 다다르는 참이었다, 천만 다행히도 폭풍도 그랬다.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았고,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다. 무릎 깊이가 되자 알렉사는 밖으로 나갔다.
밖은, 동네는, "타클로반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다, 타클로반이란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앗던 것처럼 생각됐다."
#하이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