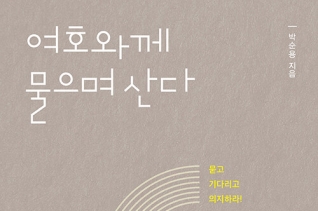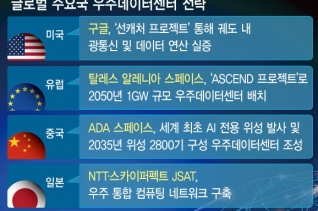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한중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성사된 만남으로 ‘사드’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됐다는 희망 섞인 기대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냉정한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지난 2017년 방중 때 노골적으로 홀대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의전의 격을 높여 예를 갖추는 등 중국 측이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겉 포장이 화려해 보여도 회담 성과를 말해주는 공동성명이나 제대로 된 발표문 한 줄 없었다는 점에서 알맹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문서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위성락 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무슨 의지를 어떻게 확인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사드’ 배치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한령’에 대해서도 중국 측은 끝내 아무런 언급도,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사 표시일 것이다. 동시에 ‘양안’ 문제에 한국을 끌어들여 지렛대로 삼으려는 계산된 의도로 비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격은 시 주석이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드러나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을 압박하려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지금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다시 강대국 간에 서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힘 대 힘의 대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 간 대결 구도에서 대한민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이 대통령의 의중은 국익에 맞춘 실용외교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자체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있어 한 발을 빼는 듯한 중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