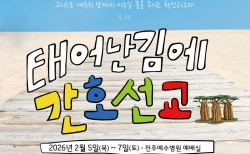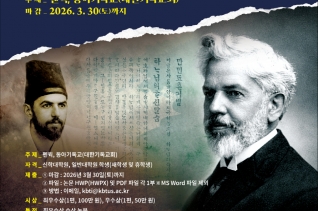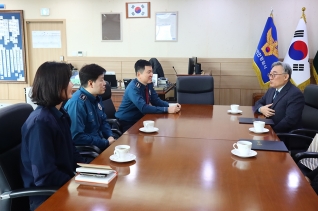지난 6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 교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2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이번 공격은 시리아 내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조직적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인권변호사이자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종교자유 옹호 국장인 켈시 조르지(Kelsey Zorzi)는 “이번 공격은 단순한 종파 갈등이 아니라 소수 종교 공동체를 겨냥한 체계적인 폭력의 일부”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영국 매체 ‘Spiked’ 기고문에서 “많은 국제 언론과 유엔이 이런 사건을 ‘종파 갈등’이라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실질적인 대응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시리아 당국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2019년 공식적으로 격퇴된 이슬람국가(ISIS)의 잔당을 지목했다. 정부는 “ISIS는 여전히 은밀한 세포조직을 통해 활동 중”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시아파 사원과 소수 종파 유적지를 겨냥한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다시 시리아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퇴진하고, 전 이슬람 무장세력이었던 아흐메드 알 샤라(현재 대통령)가 정권을 잡은 이후 소수 종교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새 정부는 종교 자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실제적인 보호 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시리아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에서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중 하나로 알려진 시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신변의 위협과 경제 붕괴 속에서 수많은 가정이 조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르지 국장은 “시리아에서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유산이 사라지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대 교회들은 단지 텅 빈 유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 야지디족, 드루즈파, 알라위파 등 소수 종파를 대상으로 강제 개종, 학살, 추방을 자행했다. 비록 영토는 상실했지만, 조르지는 “그 동일한 이념이 다른 이름과 형태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국제사회가 이 폭력의 이념적 근원을 직시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시리아의 종교적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는 종파 간 충돌이 아니라 박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폭탄 테러 이후, 시리아 기독교인들은 보복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라”, “기독교인의 피는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슬픔과 믿음을 함께 나눴다.
세계기독연대(CSW), 오픈도어 등 박해감시단체들은 시리아 정부에 대해 극단주의 청산과 종교 소수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단체들은 심리치료와 긴급 구호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지 주민들은 “또 다른 공격은 시간문제”라며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르지 국장은 “종교 박해는 국경에 갇혀 있지 않다. 무정부 상태에서 퍼지고, 국제사회가 침묵할 때 더욱 기승을 부린다. 가장 연약한 이들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안보의 시작”이라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