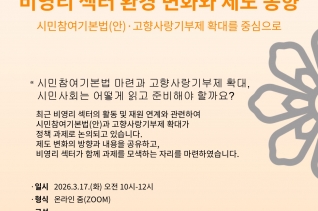내겐 늘 여행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그것은 바다에 대한 그리움에 닿아 있다. 어릴 적 바다가 있는 고향에서 자란 까닭인지, 가덕도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맞은 가을과 겨울의 남쪽 바다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다. 대학 시절,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진 동해안 해안도로 위에서 처음 본 그 바다의 넓고 짙은 빛깔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풍경은 늘 나를 불러왔다.
얼마 전 아들네가 해운대로 가족여행을 떠난 사진을 보내왔다. 화면 속 해변의 빛이 내 마음속 불을 지폈다. 그리움에 발동이 걸린 나는 어느새 동해행 경로를 찾고 있었다. 자차로 제천까지 가서, 제천역에 차를 주차한 뒤 열차를 타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렇게 마음의 발동은 행동으로 옮겨졌다.
제천에서 무궁화호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영서지방의 겨울 풍경은 낯설고도 아름다웠다. 산간 마을 언저리에 남은 눈 조각들이 흘러갔다. 여행은 늘 현실과 평상시의 나를 구분 짓는 경계를 만든다. 낯선 풍광과 만나게 하는 어떤 틈, 그 틈이 곧 여행이다.
동해역에 도착해 한섬해변 근처 숙소로 들어갔다. 날이 흐려 어둡기 전에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던져놓고 그 바다로 달려갔다. 바다는 맑은 녹빛과 거센 파도로 나를 맞았다.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이 에메랄드빛으로 변할 때, 나는 비로소 목마름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동해역에서 KTX를 타고 정동진으로 향했다. 그곳의 겨울바다는 상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들,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다. 긴 모래톱과 작은 바윗섬들, 투명한 녹색 바다는 여전히 나를 사로잡았다. 그 모든 풍경은 여행자가 되어 바라본다는 것의 기쁨이었다.
정동진을 떠나 다시 동해역으로 돌아와 추암해변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 촛대바위와 파도의 부서짐을 카메라에 담으며, 나는 여행이 단지 풍경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이라 느꼈다.
돌아오는 열차에서, 나는 왜 여행을 떠나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다. 여행의 갈증은 자신을 찾아 나서는 몸부림이다. 낯선 곳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더 잘 알게 된다. 처음 보는 풍광, 또 다른 삶의 형태 속에서 놀라움과 즐거움을 발견한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놀이를 단순한 여가가 아닌 인간 문화의 본질적 원형으로 보았다. 놀이에는 자유와 자발성, 규칙과 장소가 있다. 여행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여행은 현실과 구별된 시간이며,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스코틀랜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나는 아무 곳에도 가기 위해 여행하지 않는다. 여행 그 자체를 위해 여행한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유여행의 본질을 꿰뚫는다. 떠나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말이다.
나에게 여행은 놀이다. 여행만큼 재미를 주는 놀이는 없다. 혼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디지털 세대의 게임에 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여행은 자유다. 목마름이 있는 곳으로 그냥 떠남이다. 때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
나에게 여행은 행복이다. 설레임으로 그리움 찾아 나서기에 그렇다.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기대하며 상상하며 가기에.
그래서 여행은 인생이다. 누구나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삶이 아닌가. 마음으로 그리움을 따라 떠나는 설계는, 때론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자유여행을 통해 우리는 낯섦 속에서 자신을 다시 만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 속에서, 여행자가 되기 전의 나와는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