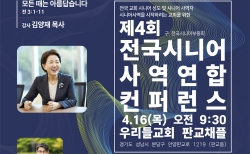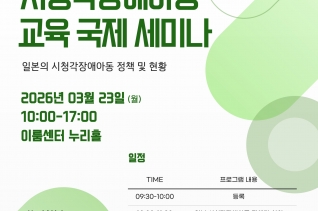낙태와 안락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으로 되짚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생명권을 개인의 선택이나 정책 효율의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의료·종교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사장 손병두)은 최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제24차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을 개최하고, 생명권을 둘러싼 철학적·법적·의료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생명권이 다른 기본권과 병렬적인 권리가 아니라,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공통된 전제로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는 생명윤리를 “인간 생명을 다루는 행위의 정당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정의하며, 태아와 말기 환자처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을 기능과 효용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생명권이 행복권이나 선택권에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학계에서는 생명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국가는 생명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를 넘어,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그는 태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생명권 주체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의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명진 원장은 “인간을 세포와 물질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은 결국 생명의 파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학의 본질은 생명을 끝내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성에 있다”고 말했다.
낙태를 둘러싼 여성 담론에 대해서는 오세라비 작가가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낙태가 여성 해방의 상징처럼 소비돼 온 흐름을 지적하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대립 구도로 설정하는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과 가족 해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생명 보호가 단지 도덕적 선언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공공 과제라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법·의료 제도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생명윤리에 기초한 국가 정책이야말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낙태와 안락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넘어, “국가는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사회 한가운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낙태 #안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