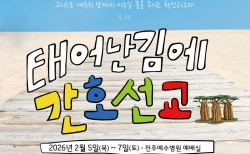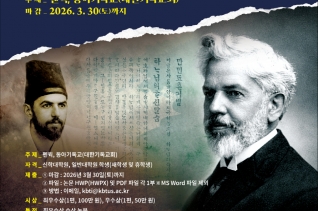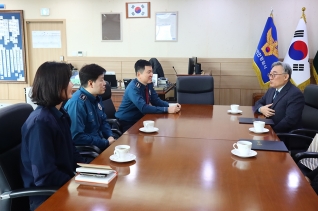[기독일보=칼럼] 요즘 나는 자건 타기와 조깅 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다.
어제도 안양천을 달리다 후배 목사가 아침 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둘레 길로 운동하러 나왔노라며 기다리라는 전갈을 받고 잠시 머무는 중 언덕 아래 콘크리트 사이로 풀잎이 솟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딱딱 하고 거친 시멘트 틈새로 싹을 틔워 살 아 남을 수 있었을까? 생명의 신비와 그 위력을 목격하게 되었다.
역사가 허버트 웰스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민족은 이스라엘일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이집트의 400년의 긴 노예 상태에서도 살아남았고 기나긴 세월 동안 나라를 잃은 채 유랑하는 민족으로 자신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급기야 잃어버린 나라를 새로 건설하고 자그마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였다. 오늘날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과 모진 시련을 겪었으나 오늘날 어였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련을 극복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생명의 근원은 조물주 하나님에게서 이고 역사를 주관 하시는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 신앙이 그들을 지탱 시켜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햇빛, 물, 그리고 공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높은데서 낮은 데로 내려온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말이 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지극히 낮은 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이미 믿음의 출발 선상에 서있지 않을까?
출애굽기9:1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 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 이다. 라고 하셨다 우리들의 존재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이란 아침에 잠깐 나났다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풀에 잠시 고였다가 말라 버리는 이슬과 다를 바 무엇이겠는가? 인간의 비극이란 인간 답 게 살지 못하는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조물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 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을 강조 하였나보다.
요즘 뉴스에 회자되는 기업 총수는 치매로 부인은 수감이 되었고 그의 두 자녀는 서로 기업의 지분 싸움으로 진 흙 탕을 일으키는 장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를 가늠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세인들의 총 망을 받던 부장 검사가 수감되는 장면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그 원인은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미가 자식의 생명을 끊기 에 이르렀다니 돈, 돈이 무엇 이 길래 생명위에 그리도 절대 군림하며 생명을 파괴 하는데 일조 하는 것일까?
우리의 현실은 인간성 자체가 굉음을 내며 충격의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저간의 경제 제일주의,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이 길러낸 이 땅의 인간상이 아닐까? 물질적 건설과 경제 성장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는 폭력, 불신, 단절, 물리적 힘 획일적 지배가 점점 더 심화 되어 이 사회는 동굴 속에서 폐허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시멘트 틈새로 오른 풀잎 새를 보며 거대한 콘크리트의 압력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네 모습을 보며 인간 자신이 부끄럽구나?
생명에 대한 시구를 떠 올려 본다.
물은 생명이다.
진정한 생명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조성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왜 인간은 생명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려 하는가?
그러고 보니 내일 주일이구려!
주일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들여 마시는 날.
말씀 속에서 생명을 흠뻑 마시자. 모진 억압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운 네 자태가 아름답구나.
시련을 격고 있는 나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