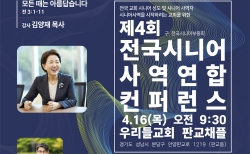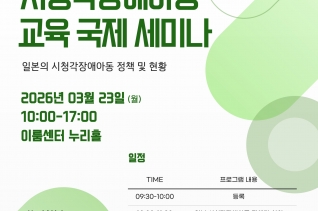여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차별금지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계는 이것이 여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전초작업이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여권 의원 11명이 발의한 옥외 광고물 관련 개정 법률안은 현행 법률 제5조 제2항 제5호의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문구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꾼 게 골자다.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차별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적시했다는 설명인데 문제는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하면 처벌하는 게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똑같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자 논평에서 “입법 만능주의와 처벌주의에 빠진 정치권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교계는 기존 법률에서 새롭게 바뀌는 조항이 거의 모두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시행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인종ㆍ성ㆍ국적ㆍ신체ㆍ나이ㆍ학력ㆍ종교ㆍ사상 등에 있어 차별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것에서 ’차별금지법‘과 판박이다.
우선 성(性)은 생물학적 성 뿐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금지하겠단 건데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언사나 표현을 하면 처벌하는 것에서 ‘차별금지법’과 차이가 없다.
‘사상’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게 한 것도 찜찜하다. 사상의 기준을 허무는 건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종북·주체사상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종북·공산주의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같은 당의 위성곤 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는데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정부도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비방성 표현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여당 주도의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선 시행령으로 틀어막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과 정부가 일제히 옥외 광고물, 특히 거리 현수막 제재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이 심각한 폐해와 혐오를 유발한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철거토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돌입한 거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건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발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에 의해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다시 규제하기로 방향을 트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는 물론 일관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앞장 선 게 민주당인데 야당에서 여당으로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되겠는가.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예민한 정치적 이슈가 거리 현수막에 내걸리는 게 정부·여당 입장에선 매우 껄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게 보기 싫다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장 선 민주당이 다시 규제 강화로 돌아서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다.
그게 정치 속성이고 생리라고 치자. 그런데 개정 법률안에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옮겨온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향후 ‘차별금지법’ 시행에 앞서 같은 효과를 옥외 광고물을 통해 얻으려는 얕은꾀가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의심이 떨쳐지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면 커다란 우(愚)를 범하는 거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힘을 국민을 억압하는데 낭비하면 그 권한을 도로 회수해 가는 게 국민의 속성이다.
도로 변에 걸린 현수막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걸리는 건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이런 종류의 현수막은 현 정부와 여당이 야당시절에 국민에게 자주 보여줬던 것들이기 아닌가. 국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체로 염증을 느끼지만, 입장과 위치가 바뀌었다고 모든 걸 뒤집는 정치 생리에 더 신물이 난다.
그동안 혐오·증오를 가장 많이, 자주 써먹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정치인들이다. 이토록 정치적 환경을 미숙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이들이 부단히 개혁·쇄신·자정에 힘써도 모자랄 판에 무조건 법으로 강제하는 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은 원색적인 비방과 표현에 혹해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게 보기 싫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만 자꾸 양산하다보면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채 뽑히게 될 것이다.
옥외 광고물을 규제하는 법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극히 염려스럽다. 보기에 따라 한국교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말은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권력에 반기를 드는 국민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엄포이자 윽박지름처럼 보인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