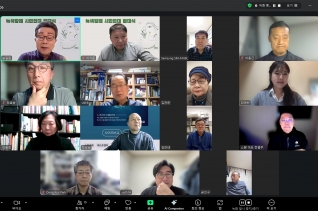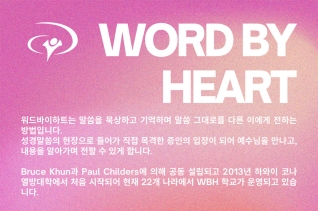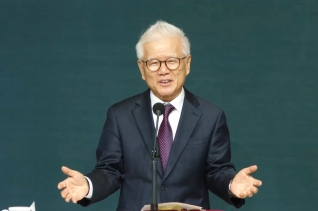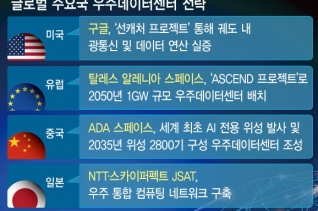음력을 여전히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구정은 신정만큼 아니 그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명절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전 시대보다 명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향을 찾아가고, 못 만났던 일가친척을 만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명절 음식을 나누며 명절을 지낸다. 기름 냄새가 진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진정한 휴식과 여유가 기대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른다. 가족이 부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로부터 확장된 혈연 그리고 계약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같이 ‘식사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이 지금 세대에는 쉽지 않을 일이 되어 버렸지만, 가족이 가장 많이 하는 공동의 작업은 바로 밥을 같이 먹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상가로서 내담자들과 가족화 (KFD: Kinetic Family Drawing) 검사를 실시해 보면, 현실에서 행하든 그렇지 않든 가족이 무엇인가 활동하는 모습에는 이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이 자주 표현된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가족이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밥상 공동체는 투사적 심리검사인 로르샤흐 검사(Rorschach Test)에서도 표현되는데 모호한 잉크 반점을 보고 ‘무엇이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음식 반응을 보일 때 임상가는 그 내담자의 내면에서의 관계 혹은 의존의 욕구 가능성을 가늠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람이 누군가와 음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성의 표현 방식이 아닐까 한다.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할 때 가장 많이 행동도 ‘밥 안 먹는다’는 식의 표현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친밀감과 의존 그리고 관계성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심리적, 관계적, 영적으로 실패감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로 음식을 만들어서 ‘와서 먹으라’고 하신다(요한복음 21장 12-13절).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수치와 죄책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기는커녕, 신선한 생선과 든든한 떡으로 제자들을 먹이신다. 이 때 예수님은 늘 우리를 든든히 먹이시는 어머니의 사랑,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다’는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근원적인 사랑이다.
이 명절에 나와 밥을 같이 먹고 싶은 가족과 이웃을 떠올려 보자. 간 만에 만난 가족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고될 수 있지만, 모두 힘을 합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수고를 나누어 보자.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은 그 고기를 구워 먹이셨던 것처럼, 누구는 밥을 하고, 전을 부치고 또 누군가는 뒷정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밥 나누는 기쁨을 나누어 보자. 그리고 혹 우리 가족의 울타리에 들지 않지만 나와 우리 가족과 밥 한 끼 나누고 싶어 하는 이가 없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그들이 떠오르고 생각난다면 같이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할까? 가족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family’는 원래 단지 혈연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하인, 노예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지녔고 그 단어가 영어의 ‘familiar’와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음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들뜨기 쉬운 때 더 소외된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마음의 공간, 그리고 그 소외된 누군가를 나의 밥상으로 초대하는 헌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던 은혜를 아는 기독교인의 명절 보내기가 아닐까?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