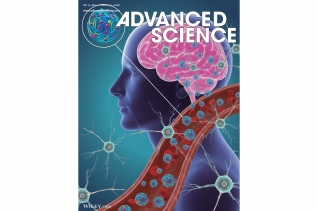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가 참여한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지난 12일 전주 전라감영에서 개막됐다. ‘하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 개막식엔 기독교 목회자를 비롯, 불교 천주교 등 지역 종교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15회째인 이 행사에 대해 주최 측은 종교 간 상생과 화합에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전북 지역의 다양한 종교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이웃 종교의 생활과 문화 예술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거란다.
그런데 축제 내용을 보면 종교간 상생과 화합이란 취지가 그리 와 닿지 않는다. 특정 종교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인 탓이다. 개막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열린 세계종교포럼은 동국대, 원광대 교수가 불교와 원불교 고승의 삶과 사상을 고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열리는 종교치유 프로그램도 원불교중앙총부, 김제 금산사 등에서 ‘나는 쉬고 싶다’라는 주제로 템플스테이와 산사음악회로 꾸며졌다.
전북 전주와 익산, 김제 등 일대는 예로부터 불교 관련 유명 고찰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원광대학교가 있는 익산은 원불교의 총본산이기도 하다. 그런 연관성에서 불교와 원불교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를 빼 놓을 수 없다. 호남, 특히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기독교인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전주와 익산의 교회들 중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들이 많다. 이들 교회들은 거의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것으로 선교사들은 복음 사역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사업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런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3.1만세운동에 앞장 서는 등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주최 측이 ‘세계종교문화축제’란 이름을 내걸 때는 지역 내에 있는 각 종교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드러내선 곤란하다. 종교간 상생과 화합이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반대로 그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주최 측이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행사를 기획할 때는 상호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엔 목회자의 이름도 빠지지 않는다. 그가 기독교를 대표할만한 인사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기독교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지는 살필 필요가 있다. 다른 종교의 들러리나 되자고 기독교의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300일 추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있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등 종교인들이 모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퍼포먼스로 불교 의식인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 ‘삼보일배’에 목회자도 함께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기독교 목회자가 불교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삼보일배’에 참여한 건 기독교 본연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도 같은 날 낸 논평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간 분들의 가족을 위로한다고 하여도 불교에 귀의하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기독교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교계 일부에선 고통당하는 분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며 도리어 한기총과 언론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일에 성직자가 나섰다고 뭐라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으면 형식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위험한 말이 어디 있나.
과거 일부 정치인이 거리에서 ‘삼보일배’를 한 사례가 더러 있다. 그 정치인이 불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어차피 대중에게 자신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직자는 다르지 않은가. 아무리 퍼포먼스라도 종교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기독교 안에서도 타종교를 포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가톨릭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종교에 대해 ‘포용과 대화의 정신’을 천명하자 1975년 개최된 WCC ‘나이로비 총회’에선 타종교에 대한 입장을 ‘우리의 이웃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며 포용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WCC의 견해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다종교 사회에서 타종교를 존중하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 문제다. 그러나 종교 간의 교류든 집회 시위 목적이든 종교인, 특히 성직자는 목적에 수단을 정당화해선 곤란하다. 포용주의가 선을 넘으면 혼합주의가 되고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계와 각성이 요구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