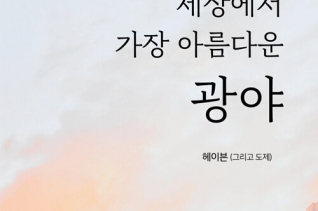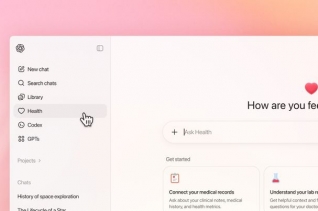미국 오리건주(州)에서 한 여성이 존엄사를 인정한 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사망했다고 현지 존엄사 지지 시민단체의 대변인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존엄사를 선택한 브리타니 메이나드(29)는 지난 1월1일 뇌종양 진단과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살던 그는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아 남편 댄 디아즈와 오리건주로 이사했다.
그는 존엄사 지지 시민단체 '연민과 선택'의 유명한 지지자였다.
이 시민단체의 숀 크라울리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성명에서 "메이나드가 전날 자신 침실에서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조용히 평화롭게 생을 마쳤다"며 "그는 자주 심한 발작, 두통, 경부통을 호소했고 뇌졸중 같은 증상을 보였다. 이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그는 몇 달 전 처방받은 약물을 먹고 숨을 거두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의 결혼사진과 함께 그의 사연은 존엄사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만 30살 생일을 3주도 채 안 남긴 지난 1일을 자신의 사망일로 정했다고 밝혔으나 후에 아마도 연기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었다. 그는 당시 자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정한 날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자신의 사망일을 앞당기거나 미룰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남편과 친척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초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가족들은 내 뇌종양이 낫는 기적을 바랐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도 치료되길 바랐었다. 지금도 치료되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 모두가 앉아서 이 사실을 두고 생각했을 때 날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가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환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하며 의사가 이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리건주에서 지난 12월31일부터 지난 750명 넘게 존엄사를 선택했으며 존엄사를 선택하는 평균 연령은 만 71세이며 메이너드처럼 만 35세 이하인 젊은 사람들은 6명이다.
오리건주는 1994년과 1997년 2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품위 있는 죽음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포틀랜드=AP/뉴시스】
#존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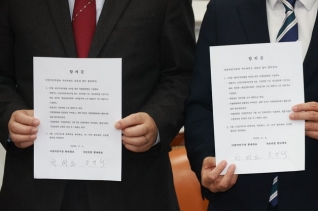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 시간)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2026.01.30.](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141689/ap-29-2026-01-30.jpg?w=318&h=211&l=42&t=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