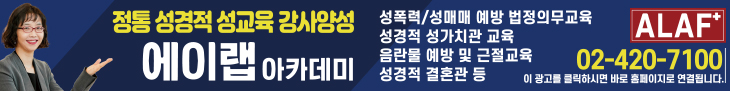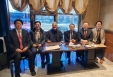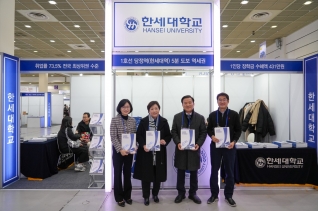II. 선교 개념의 변천 역사
1. 선교를 복음화로 이해한 시기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복음화’로 보아온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심지어 에큐메니칼 선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에딘버러 대회의 슬로건이 “이 세대 안의 이 세계의 복음화”이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에큐메니칼 학자인 이형기도 “에딘버러에서 최대의 관심은 영국, 유럽, 미국 등 선교 종주국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제3세계’에 전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52년에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47년에 열린 휫트비 대회에서도 세계 문제의 근원이 영적인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질 때 해결될 것이라는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동선도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는 ‘세계복음화’를 그 이상으로 천명했으며, 세계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는 하였지만,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가 태동될 때까지만 해도 전도는 선교의 중심과제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적어도 1950년대까지는 심지어 에큐메니칼 대회들마저도 선교를 기본적으로 ‘복음화’로 이해하거나 복음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2. ‘인간화’와 ‘복음화’ 이해가 공존한 시기
1952년에 에큐메니칼 신학의 핵심 근간인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탄생되면서부터 에큐메니칼 진영은 서서히 선교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Missio Dei 개념의 탄생과 함께 에큐메니칼 진영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복음화)”이라고 이해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세상 자체를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것(인간화)”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변화와 함께 선교는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는 이기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인간화를 위해 기여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968년 웁살라 대회와 1973년 방콕대회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웁살라 대회는 제2분과 위원회에서 “선교의 갱신”(Renewal in Mission)을 주제로 다루면서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설정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선교란 메시야적 목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선교의 수직적인 차원(복음화) 보다 수평적인 차원(인간화)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었다.
또한 방콕은 선교에서 전해져야 하는 핵심인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회심)으로부터 오늘 현 세상에서 잘 사게 하는 모든 일(해방)로 바꾸었다. 이러한 대회를 거치면서 에큐메니칼 진영은 선교를 ‘인간화’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대략 1952년 빌링겐 대회부터 1975년 나이로비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시기이며, 이 시기에 복음주의 진영은 선교를 ‘인간화’로 보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달리 선교를 ‘복음화’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3. 선교 개념을 통전적으로 이해한 시기
이 시기는 ‘복음화’와 ‘인간화’를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중요한 선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다. 에큐메니칼 진영의 경우는 이 시기가 1975년 나이로비 대회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고 연합하신다.”(Jesus Christ Frees and Unites)는 주제로 열린 나이로비는 인간화에 기울어져 있던 경향에서 통전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이용원은 “한 마디로 나이로비의 관심은 통전적 선교(the wholistic mission)에 있었으니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과 봉사가 통합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이후 에큐메니칼 문서들은 전반적으로 통전적 선교 개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회의 선교 문서라 할 수 있는 “선교와 전도: 하나의 에큐메니칼 확언”(Mission and Evangelism: An Ecumenuical Affirmation)은 복음화와 인간화를 구분하는 것 자체를 이분법으로 보면서, “교회는 복음전도와 사회 행동 사이의 해묵은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상의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전혀 새롭게 선교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예수 안에서 ‘영적인 복음’과 ‘물질적인 복음’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강조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년에 채택된 에큐메니칼 선교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Together towards Life)는 인간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던 전통적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전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선교는 항상 은혜를 주시는 활동 속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소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을 넘어서 모든 피조생명체와 우리들과의 화해된 관계성을 표현하는 선교 유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복음주의 진영인 로잔도 에큐메니칼 진영의 영향을 서서히 받으면서 통전적 선교 개념으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이형기는 “… 1989년 마닐라 Manifesto에 오면 종전의 ‘교회 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1952년 빌링겐의 Missio Dei 이래의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을 대폭 수용한다.”고 분석하였다. 박보경도 “케이프타운 서약문에는 로잔선언문과 마닐라 선언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선교의 포괄적 이해가 명백하다. … 요약하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3차대회는 로잔진영이 ‘전도의 우선성’으로부터 총체적 선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하면서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개념도 통전적 개념으로 변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교 개념의 흐름은 앞장에서 살펴본 구원 개념의 흐름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즉 선교를 ‘복음화’로 인식하던 시기의 구원관은 주로 ‘개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선교를 ‘인간화’로 인식하던 시기에는 구원을 주로 ‘육신의 구원과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선교의 개념을 통전적으로 이해한 시기에는 구원의 개념도 개인구원, 사회구원,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으로 이해되었다. (계속)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성결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에서 수학한 후,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신학석사(Th.M) 학위와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총회 파송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 객원교수, Journal of Asian Mission 편집위원, 한국로잔 연구교수회장,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Rethinking the Theology of WCC』,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선교 주제 28가지』, 『현대 선교학 개론』(공저), 『한 권으로 읽는 세계 선교 역사 100장면』, 『성장하는 이슬람 약화되는 기독교』, 『현대 선교신학』, 『현대 선교의 핵심 주제 8가지』, 『현대 선교의 프레임』, 『제4 선교신학』,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 『현대 선교신학(개정판)』, 『현대 선교의 목표들』 등이 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승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