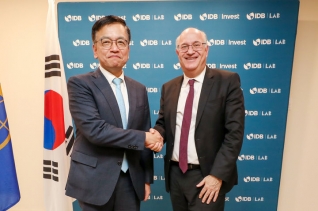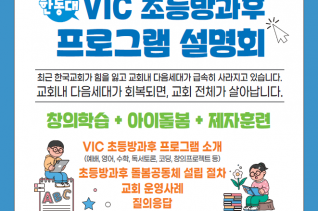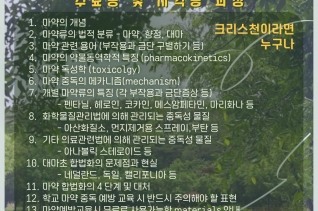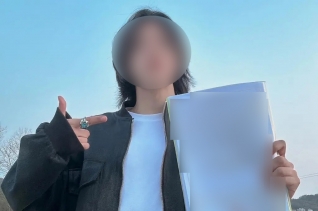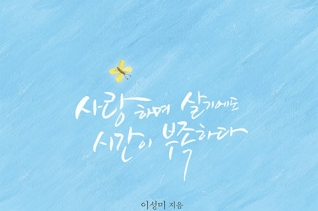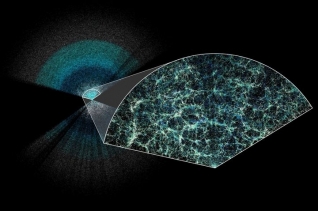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암환자들에게 병명을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정신적 타격과 치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위암이면 그냥 위궤양 정도라며 얼버무리고 대신 가족들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고,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는 태연한 척 웃다가도 밖에 나가면 울었습니다. 실제 암에 걸린 어떤 고령의 사제에게 그의 믿음과 정신력을 믿고 <폐암 말기입니다!>했더니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하더라는 겁니다.
설령 그런 예가 있더라도 저는 미국이나 독일의 의사들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직접 모든 진단자료들을 다 보여주며 <당신은 지금 무슨 암에 걸렸고, 현재의 진행 정도로는 수술이 어려우며 수술을 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견디시겠습니까?>라고 묻고, 특히 독일의 경우는 <종교가 있으십니까? 호스피스를 원하십니까?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하며 신앙을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 충격을 받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 이제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겠구나!>하며 오히려 몹시 진지해지고 냉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일단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자칫 환자가 자기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설마 이 나이에 내가 죽으랴>하다 졸지에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가 복막염 수술 후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제 손을 아프도록 틀어잡고 <날 살려줘! 응? 난 죽기 싫어! 무서워!>하며 애원했습니다. 평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친구라 제가 <하나님을 찾아! 주님을 불러!>라고 하자 그 친구는 거의 발악을 하듯 <하나님이 다 뭐야! 그런 거 없어!>하며 막 눈물을 흘리더니 아파 죽겠다며 빨리 의사를 불러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숨진 친구의 시신 옆에서 <나는 결코 죽음 앞에서 비겁하지 않으리라!>며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웰빙>이 현대사회의 트렌드가 된 것은 이미 한참됐습니다. 평소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웰다잉>이 대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킨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웰다잉이란 언제 죽더라도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맞자는 것입니다. 물론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데 무슨 정답 같은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다 하는 매뉴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웰빙 뿐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라틴어 경구처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웰다잉>이 아닐까 합니다.
50년 전 오늘(1965년 7월 19일 오전 0시 35분), 하와이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90세의 한국인 노인 한 분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노나라의별이보내는편지에서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