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8년 제23차 온 신학회 전문위원 세미나가 17일 오후4시부터 장신대 세교협 새문안 홀에서 개최됐다. 먼저 박형국(한일장신대 신학과 교수)가 ‘과학의 세계상과 창조 서사의 ’온 세계상‘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두번째로 최무영(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온생명에서 온문화로:복잡계와 정보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우선 박형국 교수는 강연 서두에서, 독일의 조직신학자 판넨베르그를 인용하며 “자연 사건들의 전체 과정은 우발성과 규칙성이 얽혀 있어, 그물망처럼 짜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규칙과 우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의 역사는 진행된다”며 “규칙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연 법칙은 우발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세계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연법칙은 시간의 비가역성을 전제하고 있기에, 세계 전체와 개별 사건은 일회적일 뿐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며 “반복적 행위에는 항상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그는 판넨베르크 신학을 재차 빌리며 ”하나님 행위에 대한 성서의 증언은 우발성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창조적 활동이 역장으로서 작용해,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논의조차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며 ”미래는 더 높은 완성을 향한 창조적 개방 혹은 새로움의 원천“임을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그는 “뉴튼의 물리법칙처럼 과학법칙은 동일성을 전제로 하지만, 우발성은 매순간 매번의 다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개념”이라고 밝히며, “우발성에서 배태될 수 있는 ‘창발성(emergence)’이란 규칙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방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자연법칙과 우발성은 양립하고 상호작용함으로 자연세계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연 법칙적 세계상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아마 우발성”이라며 “아마 신학자들 입장에서 법칙성도 따지고 보면 우발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판넨베르크를 인용한, 그는 “과학 법칙이 펼쳐 놓은 시간의 연속성안에서 부분적인 사건 및 개별 생명들이 상호작용하며,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세계를 생명 살림 활동으로 이끌어 종말론적 완성을 이룩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법칙의 질서를 하나님의 우발적 창조활동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 창조의 우발성과 과학적 방법론은 서로가 공명해, 창조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며 “판넨베르크는 우발성의 존재론이 과학적 방법론 한계를 지적하는 방향이 아닌, 호혜 작용으로 세계에 대한 궁극적 탐구를 효율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음”을 전했다. 끝으로, 그는 “신학은 과학과 공명함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임을 선포하는 건설적 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온신학회장을 맡고 있는 장신대 윤철호 교수가 박형국 교수의 발제에 추가발언을 덧붙였다. 그는 “우발성이란 개념은 신학적 용어가 아닌 과학적 용어”라며 “과학 법칙이 결정론적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다가 양자물리학에서 우발성이란 개념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연과학에 발견한 우발성이란 개념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방식과 과학 법칙이 조화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차용했다”며 “결국 우발성은 촘촘한 과학법칙으로 무장된 자연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둔 셈”이라 밝혔다. 덧붙여, 그는 “신학자 존 칼빈은 우연이 없으며, 이는 불신앙의 개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그런 의미로서 우발성 개념이 아님”을 말했다.
또 다른 온신학회 전문위원은 “우발성은 필연성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연성이 최대한 적을수록 학문의 관점에 유리하다”며 “우연성을 강조한 건 아마 기독교 신학이 과학에게 몰리다가, 과학이 보인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공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는 “기독교가 과학에 우위를 점하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최무영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온 생명에서 온 문화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복잡계가 연구 분야인 최무영 교수는 “진화론 및 분자생물학은 환원주의적 존재론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미시환원주의, 개체주의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원주의적 존재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각각 생물 개체들이 자발적으로 발전하기보다, 다른 개체 및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을 무시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생물체계는 복잡계로서 생명 구성원 간 협동현상”이라며 “개체 요 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짜임(체계)을 통해 복잡성으로 구성되는 게 바로 생명”임을 역설했다. “짜임은 곧 정보”라며 “이는 곧 라는 것이다.
가령, 그는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번식 못하며,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번식이 가능하다”며 “바이러스는 독자적 대사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인간도 우주에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생물은 환경과 밀접히 결부돼 있으며, 생명은 각자 개체 간 어울림으로 온 생명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했다.
한편, 그는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면서 생명활동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는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엔트로피가 증가되면, 정보는 최소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그는 “생명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점점 늘어가야 한다”며 “결국 창조주의 개입으로 뭔가 계속적 창조가 일어나야, 정보량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는 “생명체가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음으로, 적절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바로 개체와 환경사이 에너지 및 정보 교류가 있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은 모든 생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정보교류를 통해서 생명 체계는 유지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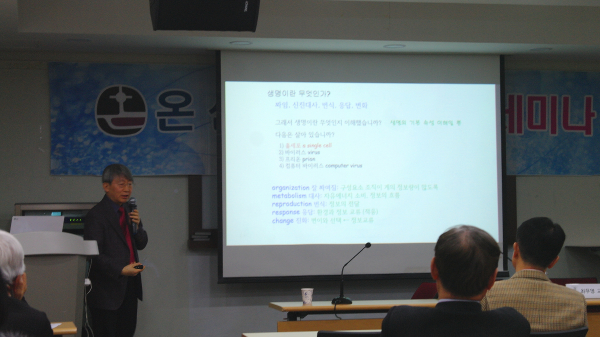
특히 그는 “자연은 질서와 무실서의 경계에 있다”며 “변이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은 자연의 복잡성을 드러내준다”고 밝혔다. 하여, 그는 “생명 체계는 발전 단계마다 새로움 및 다양성이 있다”며 “개개 요소에 의미가 있기보다, 상호 참여를 통해 복잡계 곧 창발(emergence)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그는 “복잡계는 상호참여를 통해 전체를 이루지만, 각각 개체는 자율성을 띈다”며 “상호작용하는 많은 구성원들로 인해, 개별 구성체의 특성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복잡계는 새롭게 창발 된다”고 밝혔다.
곧 많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전체 복잡계는 새롭고 더 나은 특질로 창발 된다. 매순간 매번 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말이다. 다만 그는 “복잡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인지, 저절로 진화한 결과물인지는 상관없다”며 과학이 어느 쪽도 지지 하지 않는 가치중립임을 강조했다.
가령, 그는 복잡계 모음을 제시하며, ”생물계에는 단백질, DNA, 세포막, 물질대사, 기공, 내분비와 조절계, 자가포식, 동작, 잠, 생태계와 진화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사회에는 교통그물망계, 여론 형성, 주식시장, 건축물 분포 등이 있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